|
사실 문학이란 이론만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문학 뿐이랴. 미술도 음악도 마찬가지다. 이론에 밝다고 꼭 좋은 작품은 내놓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흔히 무슨무슨 작법(作法)같은 것을 흔히 말하고, 그러한 것에 관한 책들도 내놓고 있다.
나도 졸저 『수필 ABC』(1965)에서 ‘수필 쓰는 법’의 한 장(章)을 마련하여 다음 몇 가지를 들어 말한 바 있다.
①자기의 렌즈를 갖자 ②일단의 구상은 필요하다. ③서두에서부터 관심을 이끌도록 하자 ④’누에가 실을 뽑듯’ 그렇게 써 나가자 ⑤품위있는 글이 되도록 하자 ⑥길이는 되도록 3천자 내외로 하자
는 것들이었다. 이제 보면, 여기저기서 줏어다가 열거한 것도 같고, 또 꼭 수필만이랴 다른 문학에도 마찬가지의 이야기지 않겠느냐는 항변도 있지만, 그때 내 나름으로는, 수필을 쓰고자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수필을 써 나가기 전에 먼저 가져야 할 마음가짐으로 이러한 여섯 가지를 들어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에도 수필을 쓰고자 한 사람이면 이만한 유의점은 필요한 것이 아닐까. 예문을 들면서 다시 생각해 본다.
⑴ 나는 이 바위 앞에서 바위의 내력을 상상해 본다. 태초에 꿈틀거리던 지심의 불길에서 맹렬한 폭음과 함께 퉁겨져 나온 이 바위는 비록 겉은 식고 굳었지만 그 속은 아직도 사나운 의욕이 꿈틀대고 있을 것이다라고 .
그보다도 처음 놓여진 그 자리 그대로 앉아 풍우상설(風雨霜雪)에 낡아가는 그 자세가 그지없이 높이 보였다. 바위도 놓여진 자리에 따라 사상이 한결같지 않다. 이 각박한 불모(不毛)의 미가 또한 나에게 인상적이었다.
이는 조지훈(趙芝薰)의 「돌의 미학」 중 한 대문이다. 누구나 ‘바위’에서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훈의 ‘렌즈’에 비친 바위다. 지훈의 ‘렌즈’는 지훈의 눈이요 안목(眼目)이다.
스위스 조각가 쟈코메티는,
눈에 보이는 대로를 그린다.
고 했다. 그러나 그의 그림이나 조각은 사진기의 렌즈에 비친 어떠한 풍경도 어떠한 사람도 아니었다. 쟈코메티의 눈이 아니고는 볼 수 없는 풍경이요 사람이 그의 작품에는 담겨지고 조소되었다.
「돌의 미학」은 지훈의 안목이 아니고는 쓰여질 수 없는 수필이다. 지훈은 또 다른 한 편의 글에서,
아안(雅眼)으로 속(俗)을 관(觀)하면 속도 아가 되고, 속안(俗眼)으로 아를 관하면 아도 곧 속이다.
이 말을 한 바 있다. 수필을 쓰기 위해서는 이 ‘아안’이 필요하다. 아안은 누구에게나 일조일석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가 부단한 ‘눈의 훈련’을 통해서 비로소 가질 수 있는 ‘렌즈’인 것이다. 피천득의 「수필」에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명구,
수필은 청춘의 글은 아니요 설흔 여섯 살 중년 고개를 넘어선 사람의 글이다.
는 말도 그만한 세상살이·사람살이에서 ‘눈의 훈련’을 거쳐온 사람만이 수필다운 수필을 쓸 수 있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서 좋을 것이다.
알렉산더 스미스의 말,
수필을 쓰는 사람은 천하가 다 아는 바람둥이, 무슨 일이고 못할 게 없다. 민감한 귀와 눈, 흔히 있는 사물에서 무한한 암시를 식별하는 능력, 생각에 잠기는 명상적인 기질, 이 모든 것만 있으면, 수필가로서 수필 쓰는 일을 시작할 수 있다.
에서 수필가의 요건으로 든 ‘귀와 눈’ ’능력’ ’기질’이란 것도 따져보면 ‘눈의 훈련’을 통해 가질 수 있는 높은 ‘안목’을 이야기한 것이 된다.
수필을 쓰고자 하면, 평소 사물에 대한 높고도 우아한 자기 안목부터 부단히 닦아 지녀야 할 것이다.
⑵ 붓가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쓴 글이 수필이라고들 하지만, 막상 수필을 많이 써 본 분이면 이런 안이한 수필작법에 동의하지는 않을 것이다. 말하듯이 그대로 써 내려가면 된다는 말도 수긍이 안 간다. 글자로 표현된다는 것은 작품을 뜻하는 것이다. 작품이란 소재와 주제가 겸비되어야 하고 또 매끈하게 다듬어져야 한다. 형식과 내용이 조화되고 통일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수필도 하나의 작품일진대 이런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이것을 생각나는 대로 말하듯이 붓가는 대로 써버릴 수는 없다. 물론 쓸 수는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예술적인 작품으로 승화될 수는 없다. 낙서가 아니면 붓장난의 소산일 뿐이다.
이는 장덕순(張德順)의 수필론 「힘들게 써서 쉽게 읽혀져야」의 서두 부분이다. 흔히, 수필의 글자 풀이, ‘따를 隋, 붓 筆에서 붓가는 대로 쓰여진 글’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갖기가 쉽다. 수필을 쓴 사람의 입장에서는, ‘붓가는 대로 마음 내킨 대로 쓴 글인데’의 겸사로 수필을 말할 수 있을지라도(사실 수필이란 말을 처음 쓴 사람의 의도는 그러한 것이었다), 문학인 수필을 놓고의 이러한 생각은 금물이다.
수필의 형식이 자유롭다고 해서 막연히 붓을 들고 원고지 앞에 잠깐 써낼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수필을 위해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작가에 따라서는 대충의 구상만으로 원고지를 메꾸어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톨스토이는 대충의 구상만으로 붓을 잡았고, 써나가는 동안에 그 구상을 다져 갔다고도 한다. 그런가하면 도스토엡스키는 『죄와 벌』의 구상에 3년이 걸리고 몇 권의 노오트가 필요했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길이에 있어서는 소설에 비할 바 없는 짧은 길이의 수필이래도 무엇을 내용으로 어떻게 엮어나갈 것인가, 주제·제재·줄거리의 구상은 필요하다.
‘균형 속에 있는 눈에 거슬리지 않는 파격’의 ‘균형’과 ‘파격’을 생각하는 것도 구상에 포함되는 일이다. 수필의 초보자인 경우, 이러한 구상은 더욱 필요하리라는 생각이다.
⑶ 문장의 첫 귀절이라면, 글을 쓰는 이는 누구든지 경험한 일이겠지만 글에 있어서 최초의 1귀 같이 중요한 것은 없을 것이다. 최초의 1귀, 이것을 얻기 위해서 말하자면 모든 문장가의 노심초사는 자고로 퍽 큰 듯 보이고 그만큼 이 1귀는 문장의 가치에 대해서도 결정적인 세력을 가지고 있다. 이곳에 문장을 있게 만드는데 흰 원고지의 유혹도 확실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 어데서 졸연히 때늦이 솟아 나왔는지 모르는 이최초의 1장 같이 문장인에게 창조의 정력을 일시에 제공하므로 해서 팔면치구(八面馳驅)를 하게 하는 요소도 없을 것이니, 백 사람의 문장가를 붙들고 물어본다면 그 중에 여든은 가로되 이 최초의 1장이 얼마나 고난에 찬 최대최시(最大最始)의 문장적 위기를 의미하는 동시에 그의 모든 준비를 발전시키는 가장 중요한 지도자임을 말하리라.
이는 김진섭의 「문장의 도」의 한 대문이다. 여기 ‘문장’을 수필로 바꾸어 생각해도 마찬가지다. 수필이 짧은 글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서두의 몇 줄은 독자의 흥미와 긴장을 이끌기 위해서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계용묵(桂鎔默)은 그의 수필 「침묵의 변」에서,
이 서두 1행 때문에 살이 깎인다. 8·15 이후 내가 들었던 붓을 놓고 침묵을 지키기 거의 이태이거니와 구상까지 다 되어 있는 것도 이 서두를 내지 못해 머리 속에서 그대로 썩어 나는 게 4,5개나 된다.
고 했다. 이는 물론 소설의 경우이지만 서두가 중요하다고 하여 지나치게 거의 집착하다 보면, 이처럼 아예 글을 쓰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여, 이태준(李泰俊)은 서두를 쓰는 요령으로, ‘①너무 덤비지 말 것이다 ②너무 긴장하지 말 것이다 ③기(奇)히 하려 하지 말고 평범하려 하면 된다’의 세 가지를 들어 말하였다.
한 편 수필의 구상이 이루어졌으면, 주제나 제재, 또는 줄거리를 암시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그 서두를 시작하는 것이 무난할 것이다. 줄거리에서 서두를 이끌어 내고자 할 때에는 인물·시간·배경에 관한 말로 첫줄을 시작하는 것도 쉽게 풀어나가는 방법의 하나가 되겠다.
⑷ ‘최선의 책이란 그것을 읽는 사람이 나도 쓸 것 같다고 생각하는 책이다.’ 이것은 빠스깔의 말이다. 사실 그렇다. 그렇게 쉽게 쓸 수 있다면 나도 쓸 수 있다고 느끼게 하는 책, 그것이 정말 잘 쓴 책이다. 얘기도 그렇다. 정말 훌륭한 이야기란 쉬운 말로 쉽게 하면서 그 속에 교훈과 생명이 배어 있는 말이다. 들어서 알 수 없는 이야기는 말하는 사람 자신도 모르고 하는 이야기다. 대학에서 강의를 해보면 그것을 절실히 느낄 수 있다. 완전히 내 것이 된 지식일수록 쉽게 이야기 할 수 있다. 내가 아직 소화하지 못한 지식일수록 어려운 말로 어렵게 얘기하게 된다. 쉬운 말로 할 수 없으니까 어려운 말로 캄프라쥬하는 것이다. 문장의 호흡도 얘기의 호흡과 마찬가지라고 나는 생각한다.
안병욱(安秉煜)의 『문장도』에서 옮긴 것이다. 쓰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흐르는 물처럼 써야 하고, 읽는 사람은 쉽게 느끼고 젖을 수 있어야 한다.
‘누에의 입에서 나오는 액(液)이 고치를 만들 듯이’ 수필은 써지는 것이라고 한 피천득의 인용은 알렉산더 스미스의 『On the writing of essays』에 있는 말이다. 누에가 토사구(吐絲口)로부터 실을 뽑아 고치를 만드는 광경을 보면 지극히 수월스럽다.
이만한 ‘자연적인 유로(流路)’를 위해서는 그렇게 되기까지의 공정이 필요하다. 누에가 섶에 오르자면 넉 잠을 자고 다섯 돌을 맞는 탈바꿈이 있어야 한다.
한 편의 수필을 자연스럽게 흐르는 물처럼 쓰자면 먼저 아는 것이 많아야 할 것이다. 수필가에게 폭넓은 견문과 박학다식, 그리고 깊은 사색을 요구하는 것도 이에 말미암은 것이다.
⑸ 꽃가게 앞에서 고전(古典)과 양장(洋裝)이 가지런히 발을 멈춘다. 소담한 꽃묶음을 한 아름씩 안으며 맑고 아름답기가 첫애기를 기르는 산모와 같다.
이는 이동주(李東柱)의 「꽃」의 서두다. 정갈한 표현의 멋을 느끼게 한다. 비유가 시적이다. ‘고전’과 ‘양장’은 한복을 입은 여인과 양장 차림의 여인을 일컬음이다. 「꽃」의 중간에는,
사람도 그늘에 살면 생선처럼 상하기 마련인데 제마다 어둔 방, 이 한묶음 꽃을 고작 은촛대에 불을 켜듯 환히 밝히면 때로 후기(嗅氣)와 음습(陰濕)을 가시는 분향(焚香)일 수도 있는 일.
의 일절도 있다. 앞의 두 여인의 신분과 이들이 꽃묶음을 사든 까닭도 암시되어 있다.
「꽃」의 하반부(轉)에 가면,
취안(醉眼)으로 꽃을 대한 사나이란 죽순밭을 어질르는 악동(惡童)과 같이 심사가 사나와 화즙(花汁)으로 마구 문질러야 몸이 풀린다고.
의 구절이 있다. 이어서 이른바 홍등가에서 들을 수 있는 대화가 나오고,
비린 외어(外語)가 어색지 않다. 하룻밤 청춘이 박리로 팔리는데, 흥정에 따라 에누리가 있고 악착같은 거간이 붙는다. 정희와 희순이는 간간 나들이를 한다. 때로 꽃가게 앞에서 가지런히 발을 멈춘다.
로, 「꽃」의 결말이 맺어진다. 사람살이에 있어서도 그늘진 곳의 추한 이야긴데, 「꽃」을 읽으면 그러한 것을 느낄 수 없다. 조촐하고 정갈한 글발은 오히려 멋까지를 느끼게 한다.
수필은 읽어서 멋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멋은 글발에 배어 있는 유모어나 위트로 드러난다. 수필 쓰는 이는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읽는이에게 회심의 미소를 짓게 하고 삼박한 재치를 안겨줄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할 일이다.
다음은 수필의 길이에 관한 문제다. 나는 『수필 ABC』에서 ‘길이는 되도록 3천자 내외로 하자’고 한 바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수필을 써보고자 하는 초보자를 위해서 한 말이었다.
수필의 길이는 참치부제하다. 마해송(馬海松)의 「편편상(片片想)」과 같은 원고지 한두장의 짧은 길이의 것일 수도 있고, 이은상(李殷相)의 「무상(無常)」이나 김태길(金泰吉)의 「흐르지 않는 세월」처럼 한 권의 책이 되는 길이의 것일 수도있다.
수필을 쓰고자 할 때 이상 몇 가지를 유의하였으면 싶다는 것으로 들어 보았다.
그러나 앞에서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글이란 이론만으로 잘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직접 써보면서 스스로 글 쓰는 법을 터득하는 길이 상책이라는 생각이다.
이러한 점에서, 수필 쓰는 법이 뭐네눠네 하는 너절한 이야기보다도 『후산시화(後山詩話)』에 나오는 구양수(歐陽脩)의 말,
-간다(看多-多讀)
-고다(做多-多作)
-상량다(商量多-多思)
로 이 글의 결말을 대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구양수는 문장에 익숙해지는 요령으로 이 3가지를 들었지만, 수필도 먼저 문장이 되어야 하느니만큼, 이 3가지는 바로 수필에 익숙해지는 요령으로 보아 다를 것이 없겠다.◑
◇최승범 문학박사 전북대 국문과를 졸업했다. 58년 「현대문학」으로 등단했으며, 한국문인협회, 예총 전북지부장을 역임했다. 저서로 『蘭緣記』, 『韓國隨筆文學硏究』, 『바람처럼 구름처럼』 , 『무얼 생각하시는가』, 『풍미산책』, 『거울』, 『蘭 앞에서』, 『3분읽고 2분생각하고』, 『朝鮮陶工을 생각한다』 등이 있다. 정운시조상, 현대시인상, 학농시가상, 가람시조문학상, 황산시조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69년 「전묵문학」을 창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전북대학교 국문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
235. 맨발 / 문태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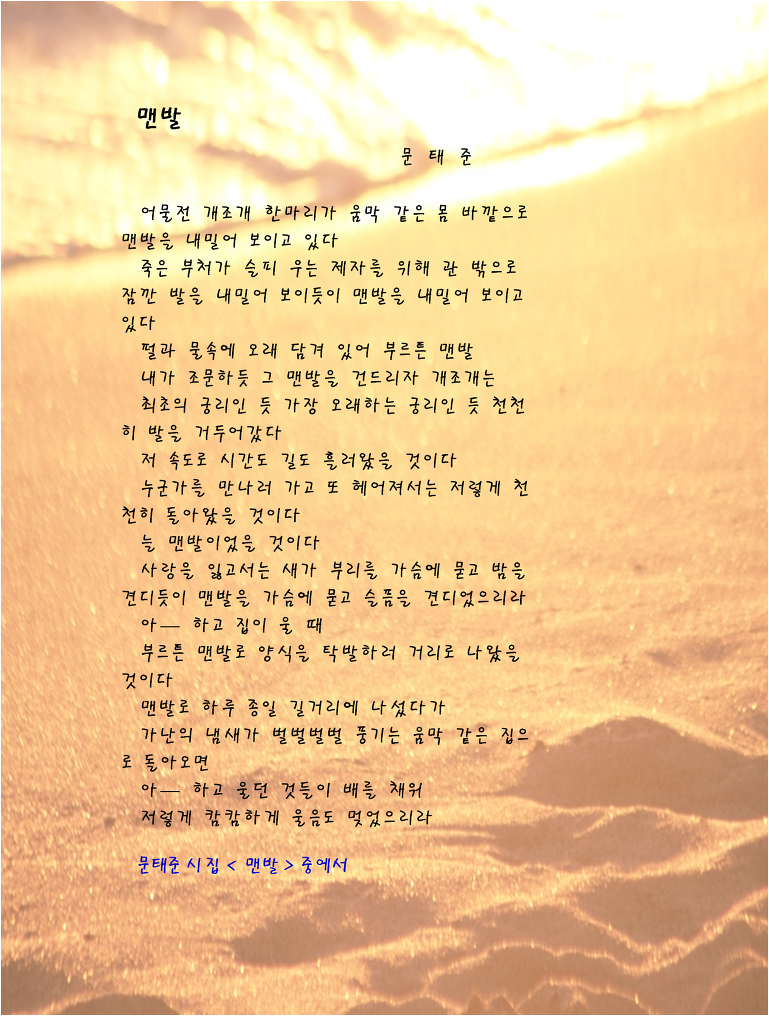
맨발
문태준
어물전 개조개 한마리가 움막 같은 몸 바깥으로 맨발을 내밀어 보이고 있다
죽은 부처가 슬피 우는 제자를 위해 관 밖으로 잠깐 발을 내밀어 보이듯이 맨발을 내밀어 보이고 있다
펄과 물속에 오래 담겨 있어 부르튼 맨발
내가 조문하듯 그 맨발을 건드리자 개조개는
최초의 궁리인 듯 가장 오래하는 궁리인 듯 천천히 발을 거두어갔다
저 속도로 시간도 길도 흘러왔을 것이다
누군가를 만나러 가고 또 헤어져서는 저렇게 천천히 돌아왔을 것이다
늘 맨발이었을 것이다
사랑을 잃고서는 새가 부리를 가슴에 묻고 밤을 견디듯이 맨발을 가슴에 묻고 슬픔을 견디었으리라
아― 하고 집이 울 때
부르튼 맨발로 양식을 탁발하러 거리로 나왔을 것이다
맨발로 하루 종일 길거리에 나섰다가
가난의 냄새가 벌벌벌벌 풍기는 움막 같은 집으로 돌아오면
아― 하고 울던 것들이 배를 채워
저렇게 캄캄하게 울음도 멎었으리라
문태준 시집 <맨발> 중에서
문태준 약력
1970년 경북 김천 출생.
태화초등학교 졸업.
김천고등학교 졸업.(중고시절 백일장에서 수차례 입상.)
1989년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입학, 1995년 졸업.
1994년 『문예중앙』신인문학상에서「處暑」외 9편 당선으로 등단.
1996년 불교방송 포교제작팀 PD.
2000년 시집 <수런거리는 뒤란> 간행.
2002년 고대문인회 신인작가상 수상
2004년 시집 <맨발> 간행. 제17회 동서문학상 및 제4회 노작문학상 수상.
2005년 제3회 유심작품상 및 2005년 제5회 미당문학상 수상. 시동인 <시힘> 동인.
2006년 시집 <가재미> 간행. 제21회 소월시문학상 대상 수상('그맘때에는' 외 15편).
2008년 시집 <그늘의 발달> 간행.
2009년 첫 산문집 <느림보 마음> 간행.
2012년 시집 <먼 곳> 간행.
-------------------------------------------------------------------
236. 극빈 / 문태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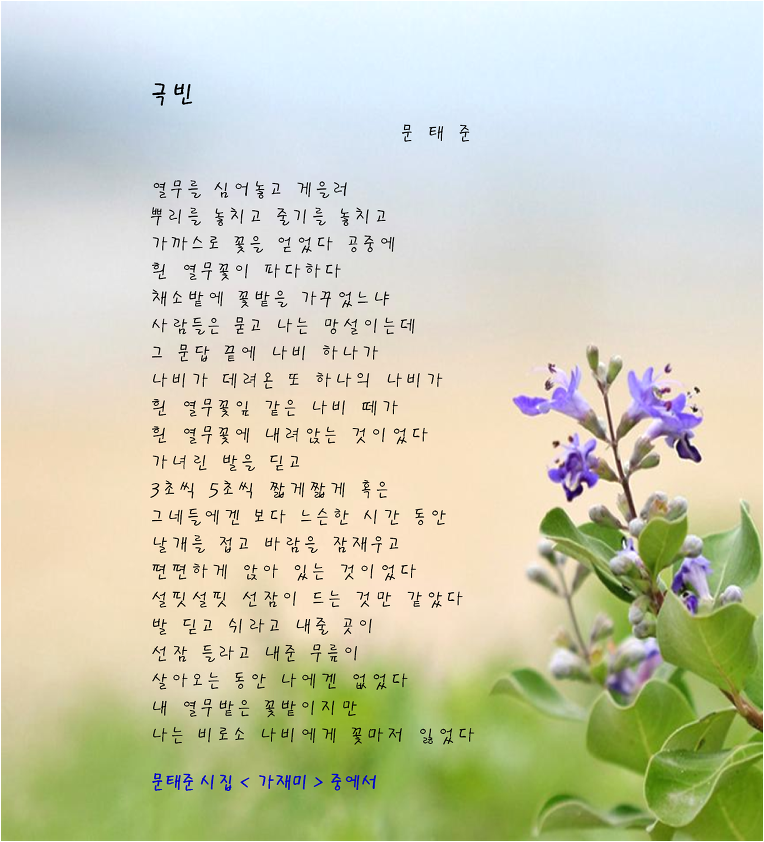
극빈
문태준
열무를 심어놓고 게을러
뿌리를 놓치고 줄기를 놓치고
가까스로 꽃을 얻었다 공중에
흰 열무꽃이 파다하다
채소밭에 꽃밭을 가꾸었느냐
사람들은 묻고 나는 망설이는데
그 문답 끝에 나비 하나가
나비가 데려온 또 하나의 나비가
흰 열무꽃잎 같은 나비 떼가
흰 열무꽃에 내려앉는 것이었다
가녀린 발을 딛고
3초씩 5초씩 짧게짧게 혹은
그네들에겐 보다 느슨한 시간 동안
날개를 접고 바람을 잠재우고
편편하게 앉아 있는 것이었다
설핏설핏 선잠이 드는 것만 같았다
발 딛고 쉬라고 내줄 곳이
선잠 들라고 내준 무릎이
살아오는 동안 나에겐 없었다
내 열무밭은 꽃밭이지만
나는 비로소 나비에게 꽃마저 잃었다
문태준 시집 <가재미> 중에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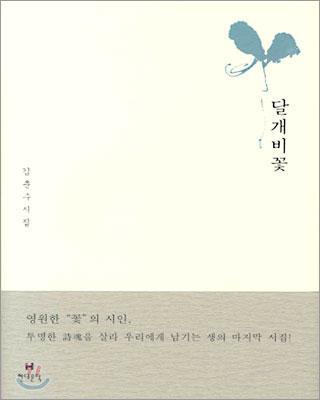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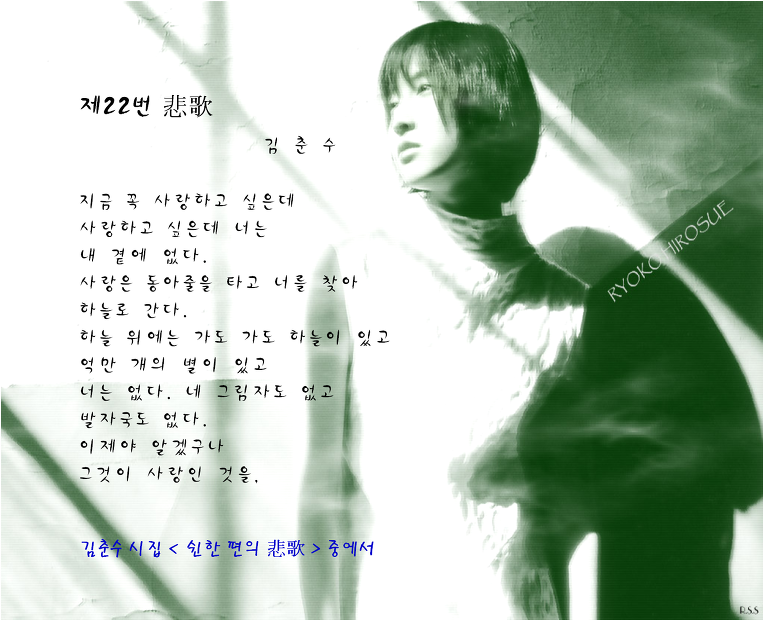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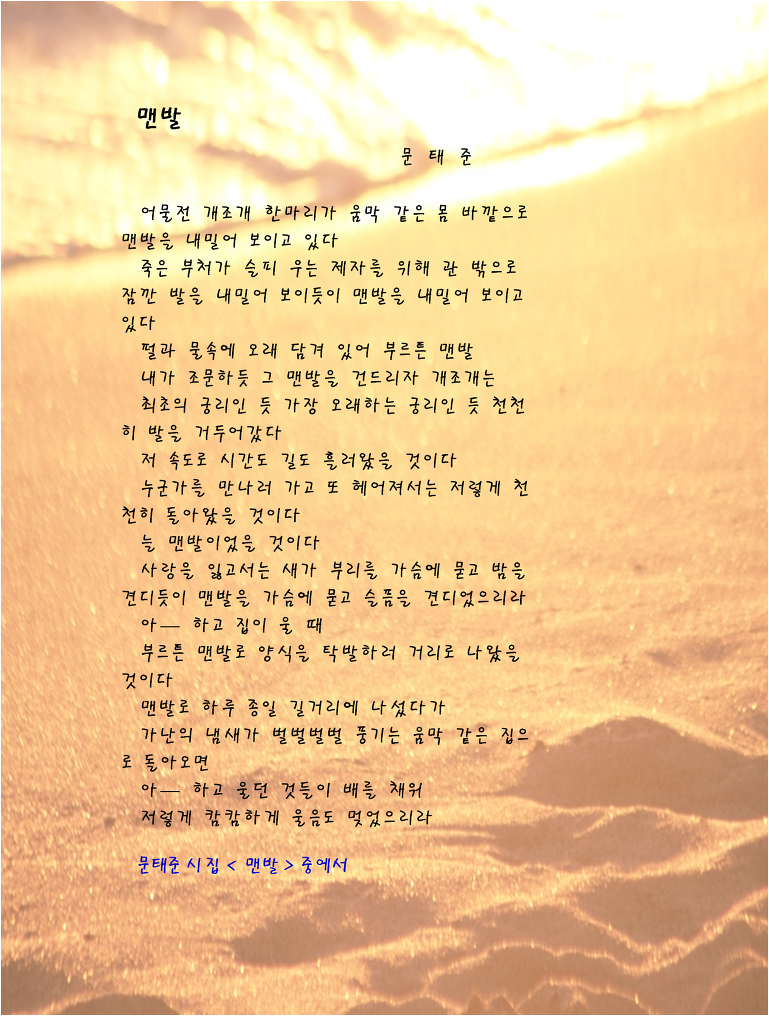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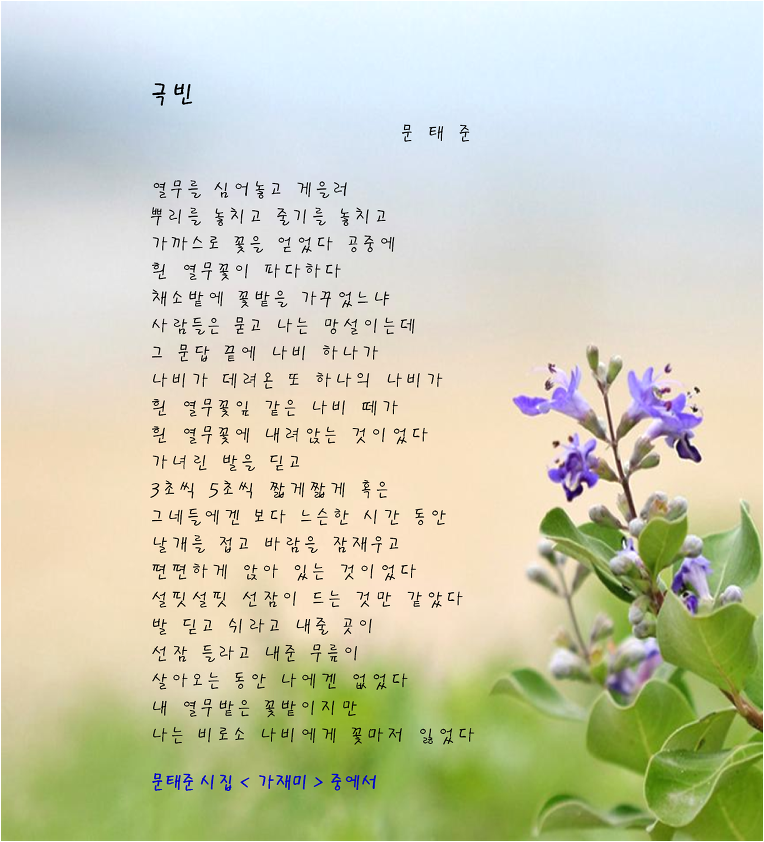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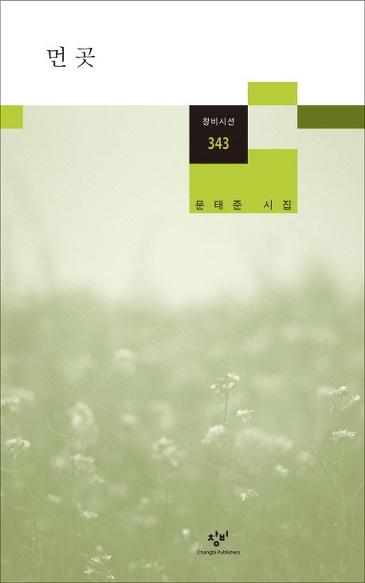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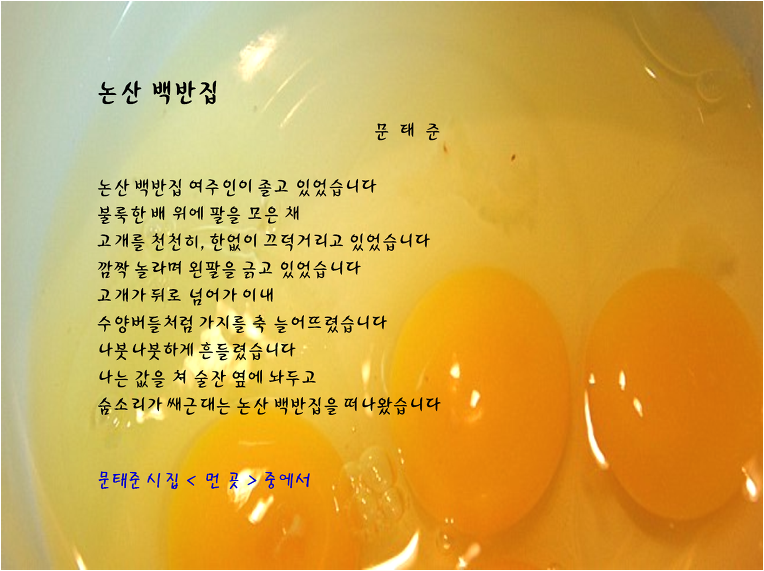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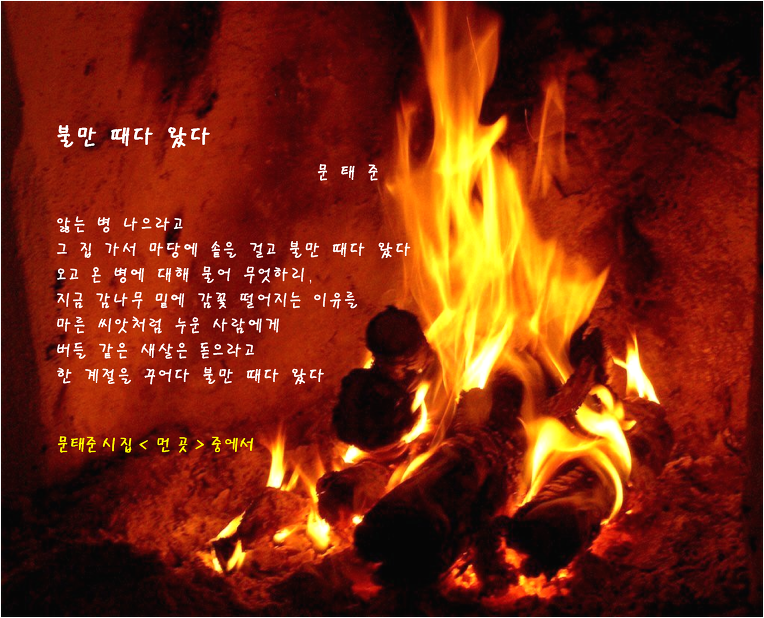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