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카테고리 : 블로그문서카테고리 -> 문학
나의카테고리 : 시인 지구촌
시적 상상력을 구사하는 방법
고재종
사랑은 시와 흡사하다. 사랑이 시와 흡사한 것은 양자가 모두 논리의 대척점에 서 있다는 사실이다. 이 남자가 누구의 남자인가는 아랑곳없이 마음의 길이 언제나 그에게 향하고, 그에게 맞닿아 있듯, 남들이 보기에는 하잘 것 없는 왜소한 존재임에도 바닥 모를 깊이로 몰두한 채 시의 길도 달리고 있는 것이다. 콩깍지가 씌어도 몇 겹으로 덧씌웠는지 알 수 없을 만치 혼미한 가운데 연인들과 시는 앞 다투어 마음의 길을 달리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에 빠졌을 때, 이 주체할 수 없는, 나 아닌 또 다른 존재를 향한 갈망 또한 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시 역시 다른 존재를 향한 짙은 그리움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시는 망망한 밤하늘의 한 점 불빛이다. 반짝반짝 또 다른 살아 있는 정신에게 보내는 간절한 신호인 것이다. 사람들 사이에 가로놓인 섬을 넘어서서 마침내 따수운 손길을 부여잡고자 하는 갈망에 찬 몸짓이 시인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 곤혹스러운, 무어라고 규정할 수 없는, 예전엔 느껴 본 적도 없던 이 독특한 감정이야말로 시와 다르지 않다. 무어라고 딱히 명명할 수 없는, 망명하는 순간 이미 그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느낌, 사랑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표현한 순간 그저 범속한 사랑이 되어버리는 절망감, 공동변소와도 같은 그런 통속적인 ‘사랑’이라는 단어로는 결코 자신만의 설렘과 두근거림을 표현할 수 없다는 안타까움. 사랑이라는 범속한 단어 그 근처에서 기미라도 알아차리게 만드는 단어를 결코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자신만의 고유한 사랑을 전해줄 언어를 모색하는 지난한 과정, 이것이 시쓰기의 심부에 닿아있는 작업인 것이다.
오직 자신만의 관점으로 세계를 보는 완벽한 주관성, 자신의 세계를 방기할 정도로 타자에 몰두하는 전적인 沒我. 그 어떤 언어로도 자신을 드러낼 수 없다는 절망과 모색 등이야말로 시와 사랑의 교차지점이다. 이들 특성은 견고한 세계의 질서를 모두 자신의 열망 안으로 끌어들이며, 외적 대상 자체로부터 사유를 시작하는 바탕을 이루며, 직접적인 제시 대신 함축적인 은폐를 기도하게 만든다. 그리고 이 모든 독특한 갈망들을 연상은 너끈히 감당한다. 연상이야말로 의미를 은폐하고 세계를 자신의 내부로 끌어들이는 유효한 방법이며 모든 세계를 한 곳으로 끌어 모으는 힘인 것이다. 사랑에 빠진 여자는 모든 존재하는 대상들을 그 남자와 연결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것이다.
(7) 산수유 - 정진규
수유리라고는 하지만 도봉산이 바로 咫尺이라고는 하지만 서울 한복판인데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다 정보가 매우 정확하다 훌륭하다 어디서 날아온 것일까 벌떼들, 꿀벌떼들, 우리집 뜨락에 어제오늘 가득하다 잔치잔치 벌였다 한 그루 활짝 핀, 그래, 滿開의 산수 유, 노오란 꽃숭어리들에 꽃숭어리들마다에 노랗게 취해! 진종일 환하다 나도 하루종일 집에 있었다 두근거렸다 잉잉거렸다 이건 노동이랄 수만은 없다 꽃이다! 열려 있는 것을 마다할 것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 건 세상 어디에도 없다 그럴 까닭이 있겠는가 사전을 뒤적거려 보니 꿀벌들은 꿀을 찾아 11킬로미터 이상 往復한다고 했다 그래, 왕복이다 나의 사랑도 일찍이 그렇게 길 없는 길을 찾아 왕복했던가 너를 드나들었던가 그래, 무 엇이든 왕복일 수 있어야지 사랑을 하면 그런 특수망을 갖게 되지 光케이블을 갖게 되지 그건 아직도 유효해! 한 가닥 염장 미역으로 새까맣게 웅크려 있던 사랑아, 다시 노오랗 게 사랑을 採蜜하고 싶은 사람아, 그건 아직도 유효해!
꿀벌떼들이 찾아온다. 서울 한복판에 벌떼들이 뜨락의 만개한 산수유를 찾아온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얼마나 정보가 정확하기에 아파트숲과 소음과 시멘트와 먼지 속을 뚫고 꿀벌들이 찾아왔을까. 그 꿀벌 떼들의 꽃숭어리 잔치에 시인도 하루종일 두근거리고 잉잉거리고 노랗게 취한다. 그걸 지켜보다가 시인은 결국 사전을 뒤적인 끝에 ‘왕복’이라는 단어를 찾아낸다. 산수유와 벌떼들, 그 둘을 하나로 이어주는 단어, 왕복! “그래, 왕복이다” 우리들의 사랑도 왕복인 것이다. 길 없는 길을 찾아 왕복하는 것이다. 그런 사랑을 하게 되면 자연히 사람도 특수 통신망인 광케이블을 갖게 되어서 네 속을 드나드는 것이다. 특수 통신망 광케이블이라는, 시에는, 더구나 사랑시에는 너무나 비시적인 언어로 충분한 낯설게 하기를 감행하면서 시를 고양시켜 나간다. 이 시의 절정은 ‘염장 미역’이란 비유다. 자신의 내면에 빼빼 마르고 까맣게 졸아든 채로 웅크려 있는 염장 미역 같은 사랑이 사랑의 물을 만나면 바가지 가득 부풀다가, 마침내 바호밥나무처럼 무성하게 자라 어린 왕자의 별을 휘감게 되는 것이다. 산수유 꽃숭어리와 벌떼들로부터 연상해낸 사랑은 마지막 행에 이르러 ‘노오랗게 사랑을 채밀하고 싶은 사람아’라는 호소력 있는 호명으로 모든 대상을 하나로 결합하며 시적 화자 자신을 명료하게 드러내고, 다분히 김수영을 연상시키는 “아직도 유효해!”의 ‘!’로 시를 끝맺고 있다. 더더욱 이 시가 감동적인 것인 시적 화자의 나이가 60살 가까이 된, 이젠 사랑보다는 생을 관조해야될 나이에 이런 연상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허망함처럼 “아직도 유효해!”라고 외치는 그 사랑도 필경 허무로 끝날지 모르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다. 사랑은 그만큼 생을 맹목적이게 만들기도 하는 것이다.
(8) 明鏡 - 박형준
강나루 가에는 커다란 버드나무가 자라고 있었다
나는 소매에서 책을 꺼내 읽었다
여인들이 버드나무 밑에서 울고 있었다
여인들은 잎이 무성한 버드나무를 꺾었다
배에 올라탄 남정네들에게
버드나무 가지를 둥글게 구부려 정표로 주었다
배가 떠날 시간이었다
내려서 뒤돌아보지 말고 걸어야 했다
책갈피에 버드나무 잎이 끼여 있었다
저녁 무렵 잠깐 잠이 든 사이였다
꿈속에서 한 권의 책을 손에 쥐고 있었다
꿈속에서 해가 지고 있었다
그 책은 이승에서 내가 평생 써야 할 시였다
이 슬프면서 아름다운 우화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저녁 무렵 잠깐 잠든 사이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도 해가 질 무렵이었다. 꿈속에서 한권의 책을 손에 쥐고 읽고 있었다. 그런 그 앞에선 버드나무 아래서 여인들이 울고 있고, 배가 막 떠나려 하고 있고, 배에 올라탄 남정네들에게 여인들은 사랑의 정표로 버드나무 가지를 둥글게 구부려 주고, 그 버드나무잎이 그의 책갈피에도 끼여 있지만, 배에서 내려서도 뒤돌아보지 말고 걸어야만 하는 슬픔이다. 어쩌면 인생은 덧없는 꿈이라는 상투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아니다. 여기서 배는 인생이고, 그 인생 속에서 우리는 사랑과 이별을 할 수밖에 없고, 그중 이별은 강을 건너는 행위 곧 이승과 저승으로 나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이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의 눈물을 뒤로하고 오연하게 앞으로 나아감으로 성취될 수 있는 그 무엇이 시라고 말하는, 저승까지 가져갈 것이 시라면, 뒤집어서 이승에서도 평생 써야할 시는 그 책갈피에 낀 버드나무잎같이 생생한 사랑과 이별의 변주인 시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꿈속에서 본 이별의 광경을 통해 시인이 끝내 써야할 시가 무엇인가를 조용히 연상케 하는 시인 것이다. 이제 다음 시를 보자.
먼저 그대가 땅 끝에 가자 했다/ 가면, 저녁은 더 어둔 저녁을 기다리고/ 바다는 인조 견 잘 다려놓은 것으로 넓으리라고/ 거기, 늦은 항구 찾는 선박 두엇 있어/ 지나간 불륜 처럼 인조견을 가늘게 찢으리라고/ 땅끝까지 그대, 그래서인지 내려가자 하였다// 그대는 여기가 땅끝이라 한다, 저녁놀빛/ 물려놓는 바다의 남녘은 은도금 두꺼운/ 수면 위로 왼 갖 소리들을 또르르 또르르/ 굴러다니게 한다, 발 아래 뱃소리 가르릉거리고/ 앞섬들 따 끔따끔 불을 켜대고, 이름 부르듯/ 먼 데 이름을 부르듯 뒷산숲 뻐꾸기 운다/ 그대 옆의 나는 이 저녁의 끄트막이 망연하고/ 또 자실해진다, 그래, 모든 것이 이 땅의 끝/ 벼랑에 서처럼 단순한 투신이라면야…// 나는 이마를 돌려 동쪽 하늘이나 바라다보는데/ 실루엣 을 단단하게 잠근 그대는 이 땅 끝에 와서/ 어떤 맨처음을 궁리하는가 보다, 참 그러고 보니/ 그대는 아직 어려서, 마구 젊기만 해서/ 이렇게 후욱 비린내나는 끝의 비루를/ 속 수한 것들의 무책을 모르겠구나/ 모르겠는 것이겠구나 ―(9)이문재의 「해남길, 저녁」
이문재의 시는 적어도 가식이 없다. 자신이 직면한 고통에 솔직하게 대면하고 있다. 그는 사랑의 끝이 땅끝과 마찬가지로 벼랑의 투신처럼 자명하기를 바란다. 망연자실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러나 삶이란 얼마나 너절한 것인지. 인연이란 얼마나 질긴 것인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직 어린 그대가 끝의 비루를 알지 못하는 것이 그나마 다행인 것이다. 땅끝에서 손쉽게 건져 올린 사랑의 끝을 생각하는 이 시는 풍부한 묘사와 함께 한자 성어를 적절하게 분리시킴으로써 자신의 내면을 풍자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 드러냄은 미화될 여지조차 있다. 그러나 그것은 미화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저 그렇고 그런 불륜일 따름이기 때문이다. 지독한 사랑의 끝은 비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것이 존재이유가 되어 버릴 때도 불륜이 비루일 수 있는가.
===================================================================
180. 화살 / 고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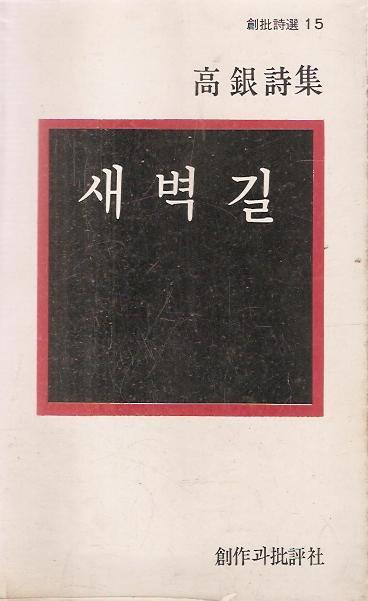
화살
고은
우리 모드 화살이 되어
온몸으로 가자
허공 뚫고
온몸으로 가자
가서는 돌아오지 말자
박혀서
박힌 아픔과 함께 썩어서 돌아오지 말자
우리 모두 숨 끊고 활시위를 떠나자
몇 십 년 동안 가진 것
몇 십 년 동안 누린 것
몇 십 년 동안 쌓은 것
그런 것 다 넝마로 버리고
화살이 되어 온몸으로 가자
허공이 소리친다
허공 뚫고
온몸으로 가자
저 캄캄한 대낮 과녁이 달려온다
이윽고 과녁이 피 뿜으며 쓰러질 때
단 한 번
우리 모두 화살로 피를 흘리자
돌아오지 말자
돌아오지 말자
오 화살
고은 시집 < 새벽길 > 중에서
-------------------------------------------------------
181. 무덤 / 고은

무덤
고은
진실은 아무리 무덤에 깊이 파묻혀도
그 무덤 뚫고 솟아 나옵니다
진실은 생명이므로
그 어둠 뚫고 솟아 나옵니다
그러나 그 진실이
오늘의 진실이 아니라
어제의 진실로 솟아 나올 때
한갓 이야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야기가 되기 전의
그 혁혁한 진실을 위하여
한사코 오늘을 지켜야 합니다
파헤쳐
푸른 불빛 날고
새빨간 진실이 솟아 나와야 합니다
그리하여 긴 밤 새어 먼동 틉니다
파헤친 무덤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야 합니다
고은 시집 < 나의 저녁 > 중에서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