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카테고리 : 블로그문서카테고리 -> 문학
나의카테고리 : 詩人 대학교
요약 비센테 알레익산드레. 스페인 시인.
1927년세대의 일원이었고 1977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초현실주의 시작법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철도기관사의 아들이었던 알레익산드레는 법학과 경영학을 전공했으며, 1920~22년에 상법을 가르쳤다. 1925년 심하게 앓기 시작해 요양기간중 최초의 시를 썼다. 1936~44년 자신의 시가 출판금지되었으나 스페인 내란 동안 스페인을 떠나지는 않았다. 1949년 스페인 왕립 아카데미 회원으로 선출되었다.
그는 자유시의 대가로 간주되었다. 그 자유시체는 초기 주요저서 〈파괴 또는 사랑 La destrucción o el amor〉(1935)에 나타나 있는데 이 작품으로 스페인 문학상을 수상했다. 그는 이 작품에서 인간과 물질적인 우주의 동일성이라는 주제를 탐구했다. 이와 유사한 주제가 〈낙원의 그늘 Sombra del paraíso〉(1944)에서도 등장한다. 인간의 삶을 더욱 강조한 작품은 시간과 죽음, 인간의 고독을 다룬 〈마음의 역사 Historia del corazón〉(1954)·〈광활한 영토에서 En un vasto dominio〉(1962) 등이다.
알레익산드레의 후기 시는 형이상학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완성의 노래 Poemas de la consumación〉(1968)·〈인식에 관한 대화 Diálogos del conocimiento〉(1974)에서는 죽음·지식·경험 등의 문제를 탐구했다. 독창적이고 심원한 시뿐만 아니라 산문작품인 〈회합 Los encuentros〉(1958)도 출판했는데, 이 책은 자신의 동료작가들을 호감을 가지고 묘사한 것이다.
====================
비센테 알레익산드레
======================
|
희망을 가지렴
-비센테 알레익산드레
그걸 알겠니? 넌 벌써 아는구나 그걸 되풀이 하겠니? 넌 또 되풀이하겠지. 앉으렴, 더는 보질 말고, 앞으로! 앞을 향해, 일어나렴, 조금만 더, 그것이 삶이란다
그것이 길이란다, 넌 무얼 갖고 있느냐? 어서, 어서 올라가렴. 얼마 안 남았단다. 아, 넌 얼마나 젊으니!
네 맑고 푸른 두 눈이 이마 위에 늘어진 너의 희 머리칼 사이로 빛나고 있구나 너의 살아 있는, 참 부드럽고 신비스런 너의 두 눈이. 오, 주저 말고 오르고 또 오르렴. 넌 무얼 바라니? 네 하얀 창대를 잡고 막으렴. 원하는 네 곁에 있는 팔 하나, 그걸 보렴. 보렴. 느끼지 못하니? 거기, 돌연히 고요해진 침묵의 그림자. 그의 투니카의 빛깔이 그걸 알리는구나. 네 귀에 소리 안 나는 말 한마디. 비록 네가 듣더라도, 음악 없는 말 한마디. 바람처럼 싱그럽게 다가오는 말 한마디. 다 해진 네 옷을 휘날리게 하는 네 이마를 시원하게 하는 말. 네 얼굴을 여위게 하는 말. 눈물 자국을 씻어내는 말. 밤이 내리는 지금 네 흰 머리칼을 다듬고 자르는 말. 그 하얀 팔을 붙잡으렴. 네가 거의 알지 못해 살펴보는 그것. 똑바로 서서 믿지 못할 황혼의 푸른 선을 쳐다보렴. 땅 위에 희망의 선을. 커다란 발걸음으로, 똑바로 가렴, 신념을 갖고, 홀로 서둘러 걷기 시작하렴. |
|
===============
너의 눈 때문에, 너의 입술 때문에, 너의 목 때문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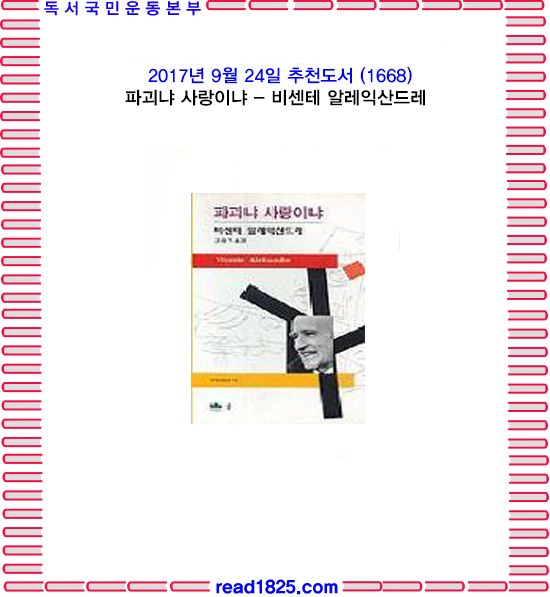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