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카테고리 : 블로그문서카테고리 -> 문학
나의카테고리 : 文人 지구촌
소멸과 존재와 돼지와 그리고 부처님과...
2016년 04월 16일 21시 05분
조회:4033
추천:0
작성자: 죽림
나는 소멸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 장경기
나는 떠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드넓은 만주 벌판의 지평선 위에는 흰 달 하나만이 명상하듯 정적에 잠겨 있었다. 소년은 일몰의 긴 그림자를 뒤로하고, 끝 모를 그리움의 눈빛으로 그 흰 달에 시선을 주고 있었다.1)황량한 벌판 위로는 어느덧 소년의 고향인 군산을 껴안고 있는 호남 벌의 벼들이 바닷물처럼 밀려와 거칠게 일렁이고 있었다.
“빈 들 가득히 입다문 사람의 숨결이여. 아무리 모진 때 살아왔건만 순된장이여 진흙이여. 언제까지나 변함없는 따뜻한 사람의 숨결이여.”2)꾸벅 인사를 하면, 땡볕에 그을린 얼굴로 환하게 웃으며 어깨를 다독여주던 마을 어른들, 일꾼들하고 일꾼네 아이들하고 저 건너 밭에 나온 아낙까지도 어서 와 어서 와 불러다가 모두모두 논두렁 한마당에서 들밥을 먹었던 고향 들판, 일제하에서 가난과 혹독한 노동으로 할퀴고 뜯긴 주름살 패인 얼굴들이었으나 얼마나 친근한 눈빛들이었던가.
오랜 마을에는
꼭 정자나무 한 그루 계십니다
오랜 마을에서는
꼭 깊은 우물 시린 물 길어 올립니다
그 물 길어 올리는 시악시 계십니다
점심 먹고 한동안 모이십니다
아무리 이 세상 막 되어가도
언제나 넉넉한 정자나무 밑으로
할아범도 아범도 나오십니다
큰 나무 하나가 스무 사람 품으십니다
땀 들이고 더위 잊고
매미 쓰르라미 소리 자욱합니다
몇마디 말 허허하고 나누십니다
가만히 보니 과연 정자나무 밑에서도
좌상 자리 있고 다음 자리 있어서
저절로 늙은이 섬기고 손윗사람 모십니다
그 무슨 개뼈다귀 예의지국이 아니라
이는 정녕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다운 세상입니다”3)
고향으로 고향으로 뻗어가던 그리움의 촉수가 여기까지 이르렀을 때였던가. 불쑥 정적 속을 꿰뚫고 질주해 온 말발굽소리가 창문을 파드드 흔들더니, 이내 흙먼지와 함성이 벌판을 뒤덮었다. 마적떼였다. 흰 달도 춤추듯 일렁이며 그들을 뒤좇아 달렸다. 소년의 마음도 함께 달렸다.
열망 하나만을 가슴에 품고, 화물차에 숨어든 채 이곳 봉천까지 단숨에 달려와버린 그의 가슴에 다시 불을 지펴놓았던 것이다. 그러나 어느새 지평선 저편으로 사라져버린 마적떼들, 흙먼지마저 너무 빨리 끝나버린 축제를 아쉬워하듯 하릴없이 땅바닥에 다시 가라앉았다. 고요의 정적 위에 흰 달도 다시 명상에 잠겨 있었다.
그러나 이미 불붙은 소년의 끝 모를 열망은 가라앉지 않았다. 그의 생각은 여전히 소실점 저편 마적떼를 좇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고향을 떠날 때 그랬던 것처럼……“나는 떠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걷고 또 걸었다.
그런 生의 어느 길목이었던가. 그는 문득 중이 되어 있었다.
1952년 그의 나이 시무살이 되던 해였으리라. 一超가 법명이었다.
曉峰선사와의 깊은 인연, 그리고 무엇이 스쳐갔던가.
인연의 끝자락에서 흔적으로 남아진 것은 한 편의 詩였다.
“많은 海印三昧 바다에 저마다 아버지가 있습니다.
저 추운 근본에 한 사람
당신은 저의 아버지였습니다.
어쩌란 말입니까.
아무도 오지 않을 때 判異하게 잎이 집니다.
이미 한 圓에 돌아간 八十年
당신은 하루하루를
저문 길을 失物을 찾듯이 눈을 번쩍 뜨고 살았습니다.
마침내 그 하루하루는 話頭 한 꼭지 달팽이였습니다.
무슨 할 말 있겠느냐.
그렇게 메마른 입 다물었습니다.
당신은 바다를 향하여 말 한마디 이루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전혀 다른 平常心으로
三千三千世界 諸佛諸菩薩을 일깨웠습니다.
어쩌란 말입니까. 한줌의 재에서 사리 부스러기에서
당신은 모습을 벗고 마침내 自在였습니다.
제 미치지 못한 울음소리 따위가 되돌아와서
다시 제 六根에 들어앉았습니다.
떠난 아버지여 늘 살아 있는 스님이여
이제 저는 저대로 따로 同行者 하나 얻어야겠습니다.
다만 바랍니다. 혼자서
어떤 산허리 잔치 밖에 있다가
이 세상 娑婆世界 좋거든 첫 손님으로 두런두런 비 맞으며 오소서.”4)
그렇게 曉峰 스님을 송별하고 또 얼마나 긴 세월을 걸어왔던가. 가물가물 앞이 흐려지면서 다리가 풀썩 고꾸라지는 것을 느끼는 순간, 철로의 차가운 금속성 감촉이 날카롭게 살 속으로 후벼왔다. 으스스 떨렸다. 얼굴은 핏기를 잃어가고, 그러나 정신만은 유난히 맑았다. 너무 굶주리면 잠이 오지 않는 것일까? 벌써 사흘째 빈 속이다. 손에 움켜쥐어지는 눈을 한웅큼 입 속에 털어 넣었다. 손이 시려왔다. 몸 위로, 얼굴로 유난히 희디흰 눈이 쌓이고 있었다.
구운 고구마의 감촉이 그리웠다. 따스한 늦가을날 털썩 밭고랑에 주저앉아 콩대로 불을 지핀 위에 고구마를 굽던 자신의 모습이 아릿한 환영처럼 떠올랐다. 그러나 곧 씁쓸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그 때문에 절도죄로 경찰서에 끌려가서 곤혹을 치렀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몸이 싸늘하게 굳어갈수록 정신은 혼곤한 포근함 속으로 깃들이며, 아릿한 그리움을 피워올렸다.
그리움이란 누군가의 품으로 깃들인다는 것이었을까?
누님이 와서 이마맡에 앉고
외로운 파스 하이드라지도甁 속에
들어 있는 情緖를 보고 있다.
뜨락의 木蓮이 쪼개어지고 있다.
한 번의 긴 숨이 창 너머 하늘로 삭아가버린다.
오늘, 슬픈 하루의 오후에도
늑골에서 두근거리는 神이
어딘가의 머나먼 곳으로 간다.
지금은 거울에 담겨진 祈禱와
소름조차 말라버린 얼굴
모든 것은 이렇게 두려웁고나
기침은 누님의 姦淫,한 겨를의 실크빛 戀愛에도
나의 시달리는 홑이불의 일요일을
누님이 그렇게 보고 있다.
언제나 오는 것은 없고 떠나는 것뿐
누님이 치마 끝을 매만지며
化粧 얼굴의 땀을 닦아 내린다.
쪵
형수는 형의 이야기를 해준다.
형수의 묵은 젖을 빨으며
고향의 屛風 아래로 유혹된다.
그분보다도 이미 아는 형의 半生涯,나는 차라리 모르는 척하고 눈을 감는다.
항상 旗 아래 있는 英雄이 떠오르며
그 영웅을 잠재우는 美人이 떠오르며
형수에게 넓은 農地에 대하여 물어보려 한다.
내가 창조한 것은 누가 이을까.
쓸쓸하게 고개에 녹아가는
눈허리의 明暗을 씻고 그분은 나를 본다.
작은 카나리아 핏방울을 혀에 구을리며
자고 싶도록 밤이 간다.
내가 자는 것만이 사는 것이다.
그리고 형의 死後를 잊어야 한다.
얼마나 많은 끝이 또 하나 지나는가.
형수는 밤의 부엌 램프를
내 기침소리에 맡기고 간다.5)
폐결핵의 기침!
그리움의 빛살이 흐릿해지면서, 흥건히 손바닥에 고여 있는 붉은 피가 눈에 들어왔다. 피는 허옇게 떨리는 손에서 망설이듯 흘러내리며, 철로 위의 흰 눈을 촉촉이 물들였다.
피를 토하고 난 뒤 바라보는 눈 덮인 세상은 얼마나 순결한 것이냐.6)
“아아 저물기 전에 노래하자. 괴로움을, 또한 첫 눈을 노래하자. 한 마리의 밤새가 되어 대낮 가득히 노래하자. 아무리 바라보아도 어제의 하늘일 뿐, 저 하늘에서는 눈이 내리고 내 가슴에서는 눈이 쌓인다. 아아 저물기 전에 노래하자 혼자도 괴로우면 여럿이구나. 아아 저물기 전에 노래하자 저물기 전에 노래하자. 나는 누구한테도 사랑 받을 수 없고 오직 눈 먼 산 보며 사랑하였다.
아아
첫눈이
내리므로
노래하고
쓰러지자.”7)
그러나 그런 감격도 잠시, 아득한 현기증이 머리 속을 고통스럽게 휘돌리더니 하얗게 지워버렸다.
=================================================================================
329. 나이 40에 / 김형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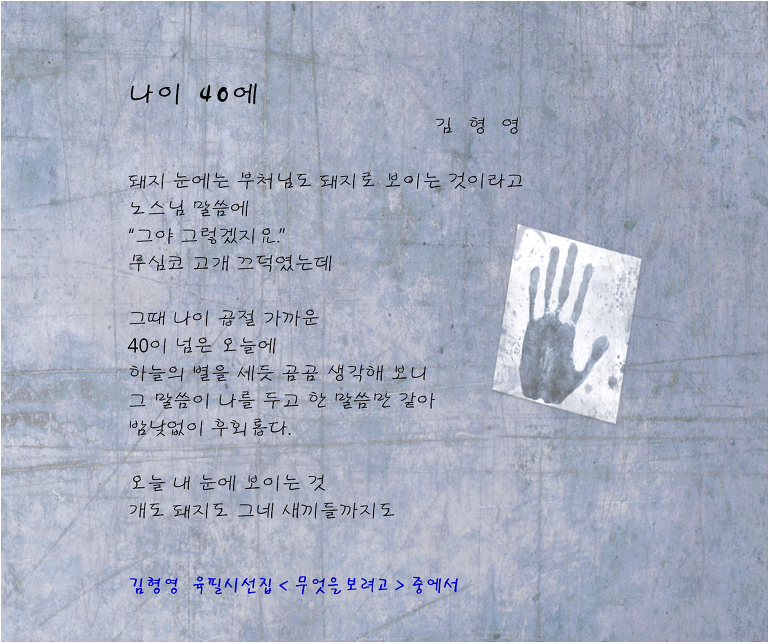
나이 40에
김형영
돼지 눈에는 부처님도 돼지로 보이는 것이라고
노스님 말씀에
“그야 그렇겠지요.”
무심코 고개 끄덕였는데
그때 나이 곱절 가까운
40이 넘은 오늘에
하늘의 별을 세듯 곰곰 생각해 보니
그 말씀이 나를 두고 한 말씀만 같아
밤낮없이 후회롭다.
오늘 내 눈에 보이는 것
개도 돼지도 그네 새끼들까지도
김형영 육필시집 <무엇을 보려고> 중에서
나는 떠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드넓은 만주 벌판의 지평선 위에는 흰 달 하나만이 명상하듯 정적에 잠겨 있었다. 소년은 일몰의 긴 그림자를 뒤로하고, 끝 모를 그리움의 눈빛으로 그 흰 달에 시선을 주고 있었다.1)황량한 벌판 위로는 어느덧 소년의 고향인 군산을 껴안고 있는 호남 벌의 벼들이 바닷물처럼 밀려와 거칠게 일렁이고 있었다.
“빈 들 가득히 입다문 사람의 숨결이여. 아무리 모진 때 살아왔건만 순된장이여 진흙이여. 언제까지나 변함없는 따뜻한 사람의 숨결이여.”2)꾸벅 인사를 하면, 땡볕에 그을린 얼굴로 환하게 웃으며 어깨를 다독여주던 마을 어른들, 일꾼들하고 일꾼네 아이들하고 저 건너 밭에 나온 아낙까지도 어서 와 어서 와 불러다가 모두모두 논두렁 한마당에서 들밥을 먹었던 고향 들판, 일제하에서 가난과 혹독한 노동으로 할퀴고 뜯긴 주름살 패인 얼굴들이었으나 얼마나 친근한 눈빛들이었던가.
오랜 마을에는
꼭 정자나무 한 그루 계십니다
오랜 마을에서는
꼭 깊은 우물 시린 물 길어 올립니다
그 물 길어 올리는 시악시 계십니다
점심 먹고 한동안 모이십니다
아무리 이 세상 막 되어가도
언제나 넉넉한 정자나무 밑으로
할아범도 아범도 나오십니다
큰 나무 하나가 스무 사람 품으십니다
땀 들이고 더위 잊고
매미 쓰르라미 소리 자욱합니다
몇마디 말 허허하고 나누십니다
가만히 보니 과연 정자나무 밑에서도
좌상 자리 있고 다음 자리 있어서
저절로 늙은이 섬기고 손윗사람 모십니다
그 무슨 개뼈다귀 예의지국이 아니라
이는 정녕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다운 세상입니다”3)
고향으로 고향으로 뻗어가던 그리움의 촉수가 여기까지 이르렀을 때였던가. 불쑥 정적 속을 꿰뚫고 질주해 온 말발굽소리가 창문을 파드드 흔들더니, 이내 흙먼지와 함성이 벌판을 뒤덮었다. 마적떼였다. 흰 달도 춤추듯 일렁이며 그들을 뒤좇아 달렸다. 소년의 마음도 함께 달렸다.
열망 하나만을 가슴에 품고, 화물차에 숨어든 채 이곳 봉천까지 단숨에 달려와버린 그의 가슴에 다시 불을 지펴놓았던 것이다. 그러나 어느새 지평선 저편으로 사라져버린 마적떼들, 흙먼지마저 너무 빨리 끝나버린 축제를 아쉬워하듯 하릴없이 땅바닥에 다시 가라앉았다. 고요의 정적 위에 흰 달도 다시 명상에 잠겨 있었다.
그러나 이미 불붙은 소년의 끝 모를 열망은 가라앉지 않았다. 그의 생각은 여전히 소실점 저편 마적떼를 좇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고향을 떠날 때 그랬던 것처럼……“나는 떠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걷고 또 걸었다.
그런 生의 어느 길목이었던가. 그는 문득 중이 되어 있었다.
1952년 그의 나이 시무살이 되던 해였으리라. 一超가 법명이었다.
曉峰선사와의 깊은 인연, 그리고 무엇이 스쳐갔던가.
인연의 끝자락에서 흔적으로 남아진 것은 한 편의 詩였다.
“많은 海印三昧 바다에 저마다 아버지가 있습니다.
저 추운 근본에 한 사람
당신은 저의 아버지였습니다.
어쩌란 말입니까.
아무도 오지 않을 때 判異하게 잎이 집니다.
이미 한 圓에 돌아간 八十年
당신은 하루하루를
저문 길을 失物을 찾듯이 눈을 번쩍 뜨고 살았습니다.
마침내 그 하루하루는 話頭 한 꼭지 달팽이였습니다.
무슨 할 말 있겠느냐.
그렇게 메마른 입 다물었습니다.
당신은 바다를 향하여 말 한마디 이루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전혀 다른 平常心으로
三千三千世界 諸佛諸菩薩을 일깨웠습니다.
어쩌란 말입니까. 한줌의 재에서 사리 부스러기에서
당신은 모습을 벗고 마침내 自在였습니다.
제 미치지 못한 울음소리 따위가 되돌아와서
다시 제 六根에 들어앉았습니다.
떠난 아버지여 늘 살아 있는 스님이여
이제 저는 저대로 따로 同行者 하나 얻어야겠습니다.
다만 바랍니다. 혼자서
어떤 산허리 잔치 밖에 있다가
이 세상 娑婆世界 좋거든 첫 손님으로 두런두런 비 맞으며 오소서.”4)
그렇게 曉峰 스님을 송별하고 또 얼마나 긴 세월을 걸어왔던가. 가물가물 앞이 흐려지면서 다리가 풀썩 고꾸라지는 것을 느끼는 순간, 철로의 차가운 금속성 감촉이 날카롭게 살 속으로 후벼왔다. 으스스 떨렸다. 얼굴은 핏기를 잃어가고, 그러나 정신만은 유난히 맑았다. 너무 굶주리면 잠이 오지 않는 것일까? 벌써 사흘째 빈 속이다. 손에 움켜쥐어지는 눈을 한웅큼 입 속에 털어 넣었다. 손이 시려왔다. 몸 위로, 얼굴로 유난히 희디흰 눈이 쌓이고 있었다.
구운 고구마의 감촉이 그리웠다. 따스한 늦가을날 털썩 밭고랑에 주저앉아 콩대로 불을 지핀 위에 고구마를 굽던 자신의 모습이 아릿한 환영처럼 떠올랐다. 그러나 곧 씁쓸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그 때문에 절도죄로 경찰서에 끌려가서 곤혹을 치렀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몸이 싸늘하게 굳어갈수록 정신은 혼곤한 포근함 속으로 깃들이며, 아릿한 그리움을 피워올렸다.
그리움이란 누군가의 품으로 깃들인다는 것이었을까?
누님이 와서 이마맡에 앉고
외로운 파스 하이드라지도甁 속에
들어 있는 情緖를 보고 있다.
뜨락의 木蓮이 쪼개어지고 있다.
한 번의 긴 숨이 창 너머 하늘로 삭아가버린다.
오늘, 슬픈 하루의 오후에도
늑골에서 두근거리는 神이
어딘가의 머나먼 곳으로 간다.
지금은 거울에 담겨진 祈禱와
소름조차 말라버린 얼굴
모든 것은 이렇게 두려웁고나
기침은 누님의 姦淫,한 겨를의 실크빛 戀愛에도
나의 시달리는 홑이불의 일요일을
누님이 그렇게 보고 있다.
언제나 오는 것은 없고 떠나는 것뿐
누님이 치마 끝을 매만지며
化粧 얼굴의 땀을 닦아 내린다.
쪵
형수는 형의 이야기를 해준다.
형수의 묵은 젖을 빨으며
고향의 屛風 아래로 유혹된다.
그분보다도 이미 아는 형의 半生涯,나는 차라리 모르는 척하고 눈을 감는다.
항상 旗 아래 있는 英雄이 떠오르며
그 영웅을 잠재우는 美人이 떠오르며
형수에게 넓은 農地에 대하여 물어보려 한다.
내가 창조한 것은 누가 이을까.
쓸쓸하게 고개에 녹아가는
눈허리의 明暗을 씻고 그분은 나를 본다.
작은 카나리아 핏방울을 혀에 구을리며
자고 싶도록 밤이 간다.
내가 자는 것만이 사는 것이다.
그리고 형의 死後를 잊어야 한다.
얼마나 많은 끝이 또 하나 지나는가.
형수는 밤의 부엌 램프를
내 기침소리에 맡기고 간다.5)
폐결핵의 기침!
그리움의 빛살이 흐릿해지면서, 흥건히 손바닥에 고여 있는 붉은 피가 눈에 들어왔다. 피는 허옇게 떨리는 손에서 망설이듯 흘러내리며, 철로 위의 흰 눈을 촉촉이 물들였다.
피를 토하고 난 뒤 바라보는 눈 덮인 세상은 얼마나 순결한 것이냐.6)
“아아 저물기 전에 노래하자. 괴로움을, 또한 첫 눈을 노래하자. 한 마리의 밤새가 되어 대낮 가득히 노래하자. 아무리 바라보아도 어제의 하늘일 뿐, 저 하늘에서는 눈이 내리고 내 가슴에서는 눈이 쌓인다. 아아 저물기 전에 노래하자 혼자도 괴로우면 여럿이구나. 아아 저물기 전에 노래하자 저물기 전에 노래하자. 나는 누구한테도 사랑 받을 수 없고 오직 눈 먼 산 보며 사랑하였다.
아아
첫눈이
내리므로
노래하고
쓰러지자.”7)
그러나 그런 감격도 잠시, 아득한 현기증이 머리 속을 고통스럽게 휘돌리더니 하얗게 지워버렸다.
=================================================================================
329. 나이 40에 / 김형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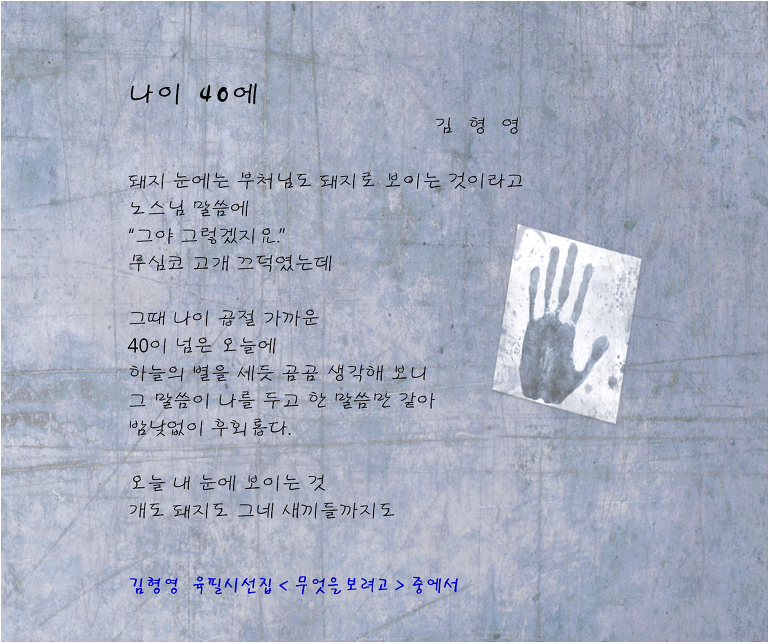
나이 40에
김형영
돼지 눈에는 부처님도 돼지로 보이는 것이라고
노스님 말씀에
“그야 그렇겠지요.”
무심코 고개 끄덕였는데
그때 나이 곱절 가까운
40이 넘은 오늘에
하늘의 별을 세듯 곰곰 생각해 보니
그 말씀이 나를 두고 한 말씀만 같아
밤낮없이 후회롭다.
오늘 내 눈에 보이는 것
개도 돼지도 그네 새끼들까지도
김형영 육필시집 <무엇을 보려고> 중에서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