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카테고리 : 블로그문서카테고리 -> 문학
나의카테고리 : 文人 지구촌
산야 도처가 내 聖域이었고
교사였으며, 詩의 발생지였다.
“여보셔. 여보셔. 열차 와분당게. 죽고 싶어 환장했소잉.”누군가의 급한 외침소리를 들으면서, 눈을 떴을 때는, 맞은 편에서 군용열차가 삼킬 듯이 질주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마음뿐 몸은 움직여주지 않았다.그런데 어느 고마운 손이냐. 옆구리를 쇠갈고리처럼 움켜쥐더니 내박치듯 끌어냈다. 노인네였다. 그는 혀를 끌끌 차면서 지그시 초췌한 젊은이의 얼굴을 들여다 보고 있었다.
“고맙습니다.”
“고맙긴, 젊은 사람이 몸을 너무 함부로 썼그만, 그란 혀도, 6·25 사변으로 산천이 전부 피멍 들어 뿔고 걸레가 돼붙는디, 몸까지 가불문 어떡한당가잉.”노인이 아니었으면 그대로 치어 죽고 말았으리라.
이미 저만치 걸어가고 있는 노인의 어깨로는 여명의 푸른 빛살이 돋아나고 있었다. 다시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다. 어디로든 떠나야 하는 것이다. 이를 악물며 두 다리를 엉버티고 일어섰다. 신기하게도 일단 일어서니 발을 옮길 수도 있었다.
“내가 마시는 물은 언제나 흐르는 물이다.
내일 모레 쓰러지리라. 승냥이 새끼야. 너 얼마나 배고팠느냐. 비록 지지리 모난 몸뚱어리일지라도 잘 뜯어 먹어라. 아주 썩어버리기 전에.”눈에 들어오는 산들은 햇살에 눈이 녹아 내리면서, 다시 그 헐벗은 모습들을 누더기 누더기 드러내고 있었다.
“내 아기 죽어 묻어버린 날
악아
악아
네가 벌써 하늘에 있구나
악아”8)
“살아 있다면 55세가 되어 여기 서 있을 그대 그대 그대, 다 죽어 흔적도 없이 머리카락 한 올도 없이 나뭇잎만 푸르다 꽃만 붉다 꽃만 희다 시대의 잘못 있어 서로 원수와 원수로 불을 뿜고 피가 튀었던 그 싸움의 세월 묻어 여기 한 그루 다친 나무로 있을 뿐 다 죽어 어디에도 그대는 없다. 그 총도 칼도 없다. 그러나 백년 뒤 그 싸움의 역사 싹 없어지지 않으리라. 지리산 세석평전 철쭉 가득히 그 역사 새겨 눈감으면 산마루마다 골짜기 골짜기마다 그대들은 거기 서 있으리라. 검은 청년으로 적의와 순결로 우뚝 서 있으리라. 하나의 토대로 그대 그대 그대.”9)동족상잔의 전쟁은 산야는 물론 그 속에 인간의 삶과 죽음까지도 신성한 것으로 지속시킬 수 없는 싸구려 품펜으로 만들어버렸던 것이다. 자신의 거덜난 육신처럼, ……“차라리 빈 논 가운데 그대로 서 있는 묵은 허수아비의 너덜너덜이여. 너에게도 바람은 피붙이였던가. 내 넝마를 휘날려주누나”
푸른 시절의 골목골목을 휘돌아, 이윽고 당도한 곳은 강화도 마니산 꼭대기의 어설프기 짝이 없는 제단터였다.
“종교인가 예술인가. 어디에 쓸어 부을 것인가.
이 손아귀에 쥐어진 좁쌀 한줌만도 못한 生의 시간들을 어디에!”긴 고뇌 속 갈림길의 터널이었다.
그리고 밤이슬에 젖은 그의 심중에 꽂힌 것은 예술이라는 화살이었다.
환속. 1962년의 일이었으니, 스물에 입산하여 서른에 하산한 셈이었다.
“시인이 된지 얼마 되지 않는 상태에서 나는 승려라는 往相의 回向에 대한 완성자의 귀환인 環相의 회향이 결코 아니었다. 아니, 그러기는커녕 그 동안 쌓아올린 어느 정도의 禪德조차도 다 내던져버린 채 내 정신에는 어떤 영향도 가늠할 수 없는 치매가 들어앉았던 것이다.
세상은 나에게 맞는 것이 아니고 나는 세상에 맞는 어떤 가능성도 없이 세상에 대해서 빙빙 겉도는 사회적 사생아에 지나지 않았다.”
그는 걷고 있었다.
제 안이 곪아가도, 고뇌의 열풍이 몰아쳐도 변함없이 걷고 있었다.
“나는 내가 승려이자 시인인 사실을 편력에 꼭 들어맞는 떠도는 자의 내면화된 의무에 넘치고 있는 천직으로 믿기 시작했다. 나는 떠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는 어떤 명제의 패러디는 사실은 그 명제보다 더 나의 삶의 절실성을 일구어낸 것이었다.”무거운 발은 그만큼 깊어 갔다. 한발 한발 옮기는 사이, 그는 자신의 몸이 길 속으로, 땅 속으로, 들풀들 속으로 스미며 섞여드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찢기고 할퀸 산이 되고 강이 되고 벌판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산의 가슴, 들의, 강의 심장이 되고 눈물이 되었다. 산야의 한숨을 토해냈고 분노로 일그러지기도 했다.
“이 모든 고단하기 짝이 없는 편력에서 내가 가는 곳마다 그곳은 새삼스러운 聖域이 되는 것 같았다. 남십자성 밑의 오스트레일리아의 대지에 떠도는 음유시인이 있었듯이, 아니 어느 나라에도 필그림의 미덕이 있었듯이 내가 태어난 조국에 대한 자연 귀속의 편력이야말로 내가 산야의 격조를 찾는 일이고 그와 함께 내 영혼의 본성도 한층 더 승화시키는 일이 될 수 있었다.
산야의 도처가 바로 내 시의 발생지였고 교사이기까지 했다. 드문 체험인 바, 그것은 나에게 입혀진 인문사회과학분야의 어떤 교양조차도 바람 부는 날의 편력이나 그 하염없는 도보 여행의 길 위에서 가능했던 것이다. 다행히도 길의 정당한 거리까지의 동행자들은 그런 인문적 대화가 가능하게 만들었던 어떤 愛智의 긴장을 불러일으켜 준 것이다.”그는 머언 길을 삶으로 하는 나그네였던 것이다.
나는 창조보다 소멸에 기여한다.
‘무엇을 향해서 나는 그리도 끝도 없이 걷고 있는 것일까?’나의 발은 땅을 딛고 산천을 서성이고 있지만, 나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서 떠나고 있는 것일까? 늘 마음속에 화두로 되뇌이는 동안 그에게 미소처럼 다가온 것은 죽음이었다. 야트막한 산에 묘지들마저 지워버리는 눈발들, 어둠 속에 그 하얀 눈내림 속에서도 그는 연신 자결하는 몸짓을 보아야 했다.
“겨울 文義에 가서 보았다.
거기까지 다다른 길이
몇 갈래의 길과 가까스로 만나는 것을
죽음은 죽음만큼
이 세상의 길이 신성하기를 바란다.
마른 소리로 한 번씩 귀를 달고
길들은 저마다 추운 小白山脈 쪽으로 뻗는구나.
그러나 빈부에 젖은 삶은 길에서 돌아가
잠든 마을에 재를 날리고
문득 팔짱끼고 서서 참으면
먼 산이 너무 가깝구나.
눈이여 죽음을 덮고 또 무엇을 덮겠느냐.
겨울 文義에 가서 보았다.
죽음이 삶을 꽉 껴안은 채
한 죽음을 무덤으로 받는 것을.
끝까지 참다 참다
죽음은 이 세상의 인기척을 듣고
저만큼 가서 뒤를 돌아다 본다.
지난 여름의 부용꽃인 듯
준엄한 正義인 듯
모든 것은 낮아서
이 세상에 눈이 내리고
아무리 돌을 던져도 죽음에 맞지 않는다.
겨울 文義여 눈이 죽음을 덮고 나면
우리 모두 다 덮이겠느냐.10)
바다도 그에게는 죽음의 바다였고 시간도 그에게는 저무는 시간이었다.
“저문 들에는 노을이 短命하게 떠나가야 한다.11))
세월이란 저문 서녘바람과 같아서, 내 눈앞이 크게 적막할 때도 있네.”12)
일체가 無화되고 다만 공허한 배경만이 남아 있는 자리에서, 그의 역은 허무라는 배역이었다. 그러나 절망을 만성질환처럼 앓으면서도 오히려 죽음을 집요하게 탐닉해갔다.
“나는 창조보다 소멸에 기여한다.”13)
“나는 왕이 아니라 옛 천자 아니라 한 톨의 망령이노라.
盛衰詩人들이여 노래하여라 나의 술과 亡國의 城을
그리고 오늘의 心琴을”14)
삶에 의해서 영글어가는 죽음의 과육 냄새,멸하는 것들의 아름다움,오, 눈부시게 아름다운 無여, 자살이여. 도취여.
‘나는 소멸의 저편에 내 스스로 마련한 피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 지도 모른다. 타박타박 걷는 걸음만으로는 닿을 수 없는 세계, 결국 그 피안의 세계에 닿기 위해서는, 마음대로 변신도 하고 전신도 할 수 있는 죽음의 관문을 넘어야 하리라.’이런 떠남과 죽음에의 피안감성!
결국 그에게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삶의 연장이었고, 삶을 위한 하나의 연습이었던 것이다.
그런 1970년 벽두, 전태일이란 섬찢한 벼락이 그의 가슴을 그었다.
==============================================================================
330. 상징은 배고프다 / 최종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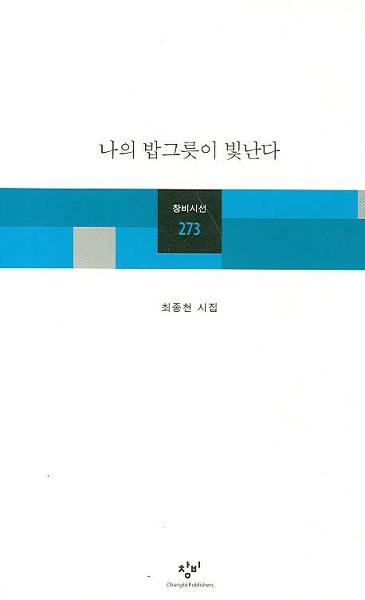
상징은 배고프다
최종천
삼풍백화점이 주저앉았을 때
어떤 사람 하나는
종이를 먹으며 배고픔을 견디었다고 했다
만에 하나 그가
예술에 매혹되어 있었다면
그리고 그에게 한권의 시집이 있었다면
그는 죽었을 것이다
그는 끝까지 시집 종이를 먹지 않았을 것이다
시의 의미를 되새김질하면서
서서히 미라가 되었을 것이다
그 자신 하나의 상징물이 되었을 것이다
최종천 시집 <나의 밥그릇이 빛이난다>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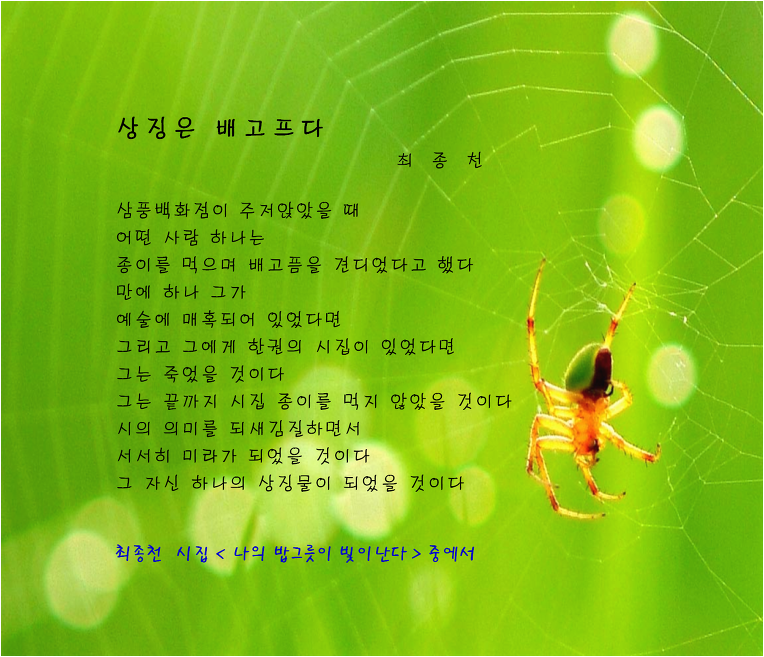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