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카테고리 : 블로그문서카테고리 -> 문학
나의카테고리 : 文人 지구촌
詩의 제목은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시켜야...
2016년 06월 03일 22시 35분
조회:4685
추천:0
작성자: 죽림
[23강] 제목은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시키어야 한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에는 이런 제목이 좋다는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3.제목은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시키고, 상상력을 발
동하게 해주어야 한다.
제목이 너무 뻔하면 독자들의 관심을 끌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한 바가 있지만 너무 익숙
한 재목은 독자가 이미 식상하여 그 다음 시를 읽
으려 하지 않습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궁금증과 기
대를 갖게 된다면 시에 대한 집중이 강해질 것은 당
연한 이치입니다.
황동규님의 <나는 바퀴를 보면 굴리고 싶어진다>
는 시의 제목을 한 번 보십시오. 우리가 일상에서
늘 만나는 것이 자동차바퀴, 자전거 바퀴, 기차
바퀴, 비행기 바퀴에 오토바이바퀴, 용달차나 딸
딸이(경운기)바퀴까지 너무 익숙한 바퀴이어서
그냥 바퀴라는 단어에는 아무도 궁금증을 품거나
무슨 상상력을 품기엔 난망한 일입니다. 그러나
나는 바퀴를 보면 굴리고 싶어진다고 하니, 아하
이 시는 과연 무슨 내용일까 하고 궁금해집니다.
이 궁금증은 시인의 상상력에 대한 궁금증인 동
시에 독자의 상상력을 끌어내는 계기도 되는 것
입니다.
그러면 시를 한 번 읽어볼까요?
나는 바퀴를 보면 굴리고 싶어진다.
저전거 유모차 리어카의 바퀴
마차의 바퀴
굴러가는 바퀴도 굴리고 싶어진다.
가쁜 언덕길을 오를 때
자동차 바퀴도 굴리고 싶어진다.
길 속에 모든 것이 안 보이고
보인다. 망가뜨리고 싶은 어린 날도 안보이고
보이고, 서로 다를 새떼 지저귀던 앞뒤 숲이
보이고 안 보인다. 숨찬 공화국이 안 보이고
보인다. 굴리고 싶어진다. 노점에 쌓여 있는 귤.
옹기점에 엎어져 있는 항아리. 둥그렇게 누워 있는 사
람들.
모든 것이 떨어지기 전 한번 날으는 길 위로.
4.시의 제목은 추상적이고 한정 범위가 넓은 것
보다 구체적인 것이 좋다.
저도 시의 제목을 많이 달아봅니다만, 너무 추상적
이라거나 한자 용어를 쓴 것, 거창한 제목 같은 것
은 독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
습니다. 구체적인 것이 훨씬 빠르고 쉽게 우리의
경험감각을 파고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의 의식을 초점화시켜 응집성을 강하게
만들기 때문이기도 하겠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김정환의 <純金의 기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닌, 순금의
기억, 아 기억만을 후대도 아닌,
손닿지 않고 보이기만 하는
보이지 않고 느껴지기만 하는
느껴지지 않고 간직되기만 하는
간직되지 않고, 있는
그런 순금의 보통명사를
남겨줄 수 있을까?
조태일님의 해설을 옮깁니다.
""기억"이라는 용어는 추상적이며, 그 한정범위가
매우 넓다. 그런데 이 용어를 "<순금의 기억>으로
한정시키고 구체화하자 제목이 강한 흡인력으로
독자의 시선을 이끄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 시의
제목은 설명문이나 논설문의 제목처럼 겉으로 직접
드러내는 것도 좋지 않지만, 독자로 하여금 뭔가
느끼거나 눈치챌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것도 결코
좋은 것은 못된다. 이런 의미에서 시의 제목이 지
닌 구체성이란 것은 "막이 오르기 전 무대에 드리
워진 반투명의 장막"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말
한다."
5.제목은 그 자체로서 의미를 증폭시켜주는 것이어
야 한다.
우리가 시를 읽을 때, 시어들이 각자 지닌 함축성
때문에 읽는 사람마다 제각기 새로운 의미로 이해
하는 것처럼, 시의 제목 또한 다양한 의미를 함축
할 수 있다면 그만큼 독자들에게 매혹적으로 다가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고정희님의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
긴다>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누가 한 번 읽어 보십시오.
적송밭 그 여백 아래 앉아 있으면
서울에서 묻혀온 온갖 잔소리들이
방생의 시냇물 따라
들 가운데로 흘러흘러 바다로 들어가고
바다로 들어가 보이지 않는 것은 뒤에서
팽팽한 바람이 멧새의 발목을 툭, 치며
다시 더 큰 여백을 일으켜
막막궁산 오솔길로 사라진다.
오 모든 사라지는 것들 뒤에 남아 있는
둥근 여백이며 뒤안길이며
모든 부재 뒤에 떠오르는 존재여
여백이란 쓸쓸함이구나
쓸쓸함 또한 여백이구나
그리하여 여백이란 탄생이구나
나도 너로부터 사라지는 날
내 마음의 잡초 다 스러진 뒤
네 사립에 걸린 노을 같은, 아니면
네 발 아래로 쟁쟁쟁 흘러가는 시냇물 같은
고요한 여백으로 남고 싶다
그 아래 네가 앉아 있는
고정희님은 자기가 태어나서 살던 집(해남군 삼산면)
의 작은 뒷동산에 묻혀있는데요. 저는 이 시를 읽
으면서 자꾸 적송 앞에 말없이 묻혀서 둥근여백으로
남아 있는 그 뒤안 길의 모습이 떠오르네요.
아주 쫄쫄쫄 흐르는 작은 개울 건너면 너른 들이
있는 잡초가 우거진 길을 따라가면 고정희님은 모든
부재 뒤에 다시 떠오른 존재가 되어 있던 것을 여기
다시 떠올려 봅니다.
아하, 제가 잠시 너무 감상적이 되었었군요. 해남에
는 유명한 시인이 많이 태어나는 곳입니다. 고정희
님의 생가 맞은 편 마을에 요즘 한참 김남주님 생가
복원을 군에서 서두르고 있습니다.
다시 교과서로 돌아갑니다.
< 모든 사라지는 것들 뒤에 여백을 남긴다>라는 제목
은 그 자체로서 우리들에게 많은 의미를 환기시키는
작용까지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읽는
사람마다 이 "여백"의 의미는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저처럼 고정희님의 생가나 묘지를 보고 온 사람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느낌이 모두 다르듯이요. 즉 이
시의 제목은 이 시를 읽는 독자들의 숫자만큼이나
많은 여백을 탄생하도록 만들면서 무한한 의미의
울림들을 자아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밖에도 시의 제목이 갖추어야할 것들이 있는데
간단히 소개만 하겠습니다.
1)시의 주제나 내용보다 제목이 지나치게 크거나
작으면 안됩니다.
2)너무 긴 제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3)어감이 좋지 않거나 발음하기 어려운 것들도
좋지 않습니다.
4)지나친 욕심으로 제목을 너무 거창하게 잡아서는
안됩니다.
요약하면 시의 제목은 무엇보다도 시의 주제나 내용
과 서로 조화되면서 "독자가 그 시의 마지막 행을
읽을 때까지 독자의 의식 속에 계속 다양한 의미망
을 형성하면서 탄력적으로 작용"해야 한다는 임보
님의 말을 경청해야할 것입니다.
아울러 독자들의 가슴에 오래 오래 남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시 읽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임종 전의 아버지 모습을 보고 쓴 신달자님의
<그때 보았다>를 읽어보겠습니다.
어깨 늠름한 젊은 시절
주머니 두둑한 중년의 의젓한
모습에도 엿볼 수 없었어라
한 점 살까지 마음까지
완연 육탈한
다만 순종 두 글자의 뼈로 누운
形骸(형해)의 끝
그때 보았다
오직 두 눈에 넘치는
맑은 섬광
딸이 처음 본
지상의 가장 아름다운
아버지.
이기철님의 <옛집>을 마지막으로 올립니다.
사랑이 있다면 네 발바닥으로 달맞이꽃을
밀어올려보렴
고통을 안쳐 한 그릇 밥을 지어보렴
이념과 체념, 동정과 연민이 들끓어 늘 뒤채이기만 했던
내 삶을
박꽃처럼 어루만져보렴
사랑이 있다면 네 손으로
앞물결만 따라가는 뒷물결의 맹목을 회초리질해보렴
발 다친 벌레도 병든 새도 없는 숲에
음악 같은 달빛을 밀어내보렴
호명해도 이미 쑥갓꽃 같은 유년은 없는 여기
그러나 책장으로 잘려가지 않은 나무들이
가지 끝에 새를 보듬고
새들은 나무들을 하늘로 끌어올린다
물소리는 왜 노래인가
걸어다니지 않는 나무의 일생을 즐겁게 해주기 위함이다.
만 사람이 밟고 가도 몸져눕지 않은 길 끝
내 유년의 별을 따던 옛집에서
사랑이 있다면 피어나는 아픔에게도
애인 같은 이름을 달아주렴
고통아
====================================================
371. 별 / 정진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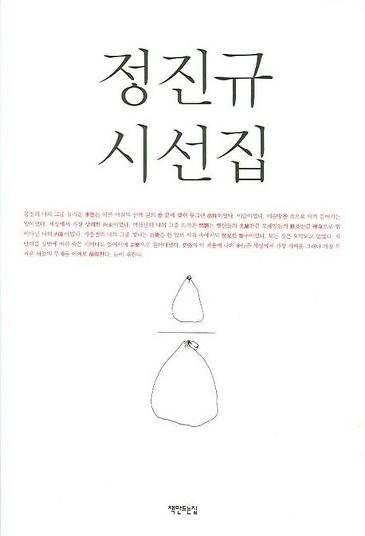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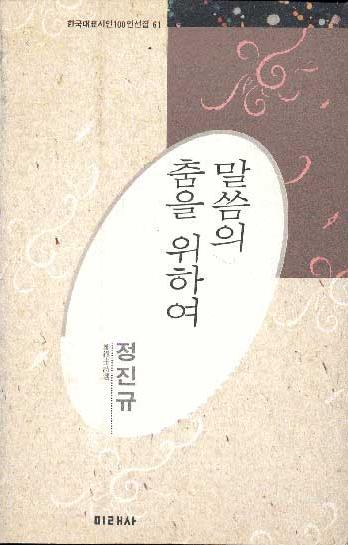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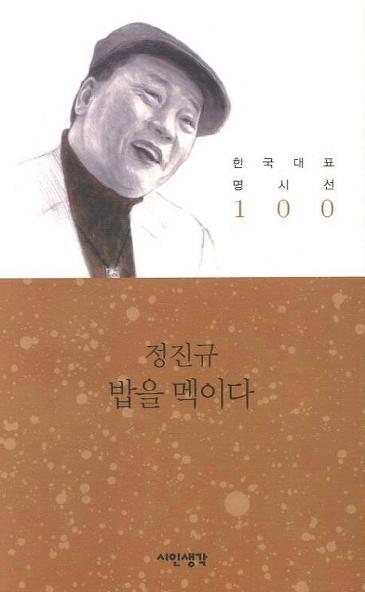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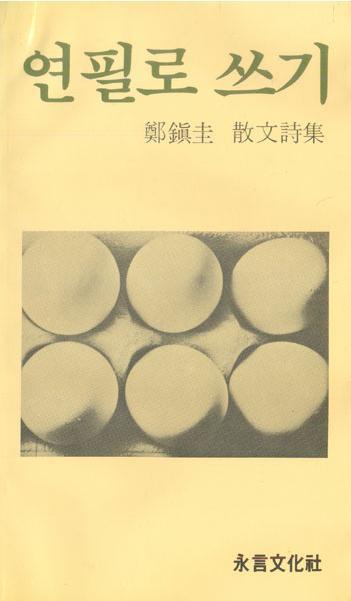

별
정 진 규
별들의 바탕은 어둠이 마땅하다
대낮에는 보이지 않는다
지금 대낮인 사람들은
별들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 어둠인 사람들에게만
별들이 보인다
지금 어둠인 사람들만
별들을 낳을 수 있다
지금 대낮인 사람들은 어둡다
정진규 시집 <별들의 바탕은 어둠이 마땅하다> 중에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에는 이런 제목이 좋다는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3.제목은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시키고, 상상력을 발
동하게 해주어야 한다.
제목이 너무 뻔하면 독자들의 관심을 끌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한 바가 있지만 너무 익숙
한 재목은 독자가 이미 식상하여 그 다음 시를 읽
으려 하지 않습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궁금증과 기
대를 갖게 된다면 시에 대한 집중이 강해질 것은 당
연한 이치입니다.
황동규님의 <나는 바퀴를 보면 굴리고 싶어진다>
는 시의 제목을 한 번 보십시오. 우리가 일상에서
늘 만나는 것이 자동차바퀴, 자전거 바퀴, 기차
바퀴, 비행기 바퀴에 오토바이바퀴, 용달차나 딸
딸이(경운기)바퀴까지 너무 익숙한 바퀴이어서
그냥 바퀴라는 단어에는 아무도 궁금증을 품거나
무슨 상상력을 품기엔 난망한 일입니다. 그러나
나는 바퀴를 보면 굴리고 싶어진다고 하니, 아하
이 시는 과연 무슨 내용일까 하고 궁금해집니다.
이 궁금증은 시인의 상상력에 대한 궁금증인 동
시에 독자의 상상력을 끌어내는 계기도 되는 것
입니다.
그러면 시를 한 번 읽어볼까요?
나는 바퀴를 보면 굴리고 싶어진다.
저전거 유모차 리어카의 바퀴
마차의 바퀴
굴러가는 바퀴도 굴리고 싶어진다.
가쁜 언덕길을 오를 때
자동차 바퀴도 굴리고 싶어진다.
길 속에 모든 것이 안 보이고
보인다. 망가뜨리고 싶은 어린 날도 안보이고
보이고, 서로 다를 새떼 지저귀던 앞뒤 숲이
보이고 안 보인다. 숨찬 공화국이 안 보이고
보인다. 굴리고 싶어진다. 노점에 쌓여 있는 귤.
옹기점에 엎어져 있는 항아리. 둥그렇게 누워 있는 사
람들.
모든 것이 떨어지기 전 한번 날으는 길 위로.
4.시의 제목은 추상적이고 한정 범위가 넓은 것
보다 구체적인 것이 좋다.
저도 시의 제목을 많이 달아봅니다만, 너무 추상적
이라거나 한자 용어를 쓴 것, 거창한 제목 같은 것
은 독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
습니다. 구체적인 것이 훨씬 빠르고 쉽게 우리의
경험감각을 파고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의 의식을 초점화시켜 응집성을 강하게
만들기 때문이기도 하겠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김정환의 <純金의 기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닌, 순금의
기억, 아 기억만을 후대도 아닌,
손닿지 않고 보이기만 하는
보이지 않고 느껴지기만 하는
느껴지지 않고 간직되기만 하는
간직되지 않고, 있는
그런 순금의 보통명사를
남겨줄 수 있을까?
조태일님의 해설을 옮깁니다.
""기억"이라는 용어는 추상적이며, 그 한정범위가
매우 넓다. 그런데 이 용어를 "<순금의 기억>으로
한정시키고 구체화하자 제목이 강한 흡인력으로
독자의 시선을 이끄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 시의
제목은 설명문이나 논설문의 제목처럼 겉으로 직접
드러내는 것도 좋지 않지만, 독자로 하여금 뭔가
느끼거나 눈치챌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것도 결코
좋은 것은 못된다. 이런 의미에서 시의 제목이 지
닌 구체성이란 것은 "막이 오르기 전 무대에 드리
워진 반투명의 장막"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말
한다."
5.제목은 그 자체로서 의미를 증폭시켜주는 것이어
야 한다.
우리가 시를 읽을 때, 시어들이 각자 지닌 함축성
때문에 읽는 사람마다 제각기 새로운 의미로 이해
하는 것처럼, 시의 제목 또한 다양한 의미를 함축
할 수 있다면 그만큼 독자들에게 매혹적으로 다가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고정희님의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
긴다>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누가 한 번 읽어 보십시오.
적송밭 그 여백 아래 앉아 있으면
서울에서 묻혀온 온갖 잔소리들이
방생의 시냇물 따라
들 가운데로 흘러흘러 바다로 들어가고
바다로 들어가 보이지 않는 것은 뒤에서
팽팽한 바람이 멧새의 발목을 툭, 치며
다시 더 큰 여백을 일으켜
막막궁산 오솔길로 사라진다.
오 모든 사라지는 것들 뒤에 남아 있는
둥근 여백이며 뒤안길이며
모든 부재 뒤에 떠오르는 존재여
여백이란 쓸쓸함이구나
쓸쓸함 또한 여백이구나
그리하여 여백이란 탄생이구나
나도 너로부터 사라지는 날
내 마음의 잡초 다 스러진 뒤
네 사립에 걸린 노을 같은, 아니면
네 발 아래로 쟁쟁쟁 흘러가는 시냇물 같은
고요한 여백으로 남고 싶다
그 아래 네가 앉아 있는
고정희님은 자기가 태어나서 살던 집(해남군 삼산면)
의 작은 뒷동산에 묻혀있는데요. 저는 이 시를 읽
으면서 자꾸 적송 앞에 말없이 묻혀서 둥근여백으로
남아 있는 그 뒤안 길의 모습이 떠오르네요.
아주 쫄쫄쫄 흐르는 작은 개울 건너면 너른 들이
있는 잡초가 우거진 길을 따라가면 고정희님은 모든
부재 뒤에 다시 떠오른 존재가 되어 있던 것을 여기
다시 떠올려 봅니다.
아하, 제가 잠시 너무 감상적이 되었었군요. 해남에
는 유명한 시인이 많이 태어나는 곳입니다. 고정희
님의 생가 맞은 편 마을에 요즘 한참 김남주님 생가
복원을 군에서 서두르고 있습니다.
다시 교과서로 돌아갑니다.
< 모든 사라지는 것들 뒤에 여백을 남긴다>라는 제목
은 그 자체로서 우리들에게 많은 의미를 환기시키는
작용까지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읽는
사람마다 이 "여백"의 의미는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저처럼 고정희님의 생가나 묘지를 보고 온 사람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느낌이 모두 다르듯이요. 즉 이
시의 제목은 이 시를 읽는 독자들의 숫자만큼이나
많은 여백을 탄생하도록 만들면서 무한한 의미의
울림들을 자아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밖에도 시의 제목이 갖추어야할 것들이 있는데
간단히 소개만 하겠습니다.
1)시의 주제나 내용보다 제목이 지나치게 크거나
작으면 안됩니다.
2)너무 긴 제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3)어감이 좋지 않거나 발음하기 어려운 것들도
좋지 않습니다.
4)지나친 욕심으로 제목을 너무 거창하게 잡아서는
안됩니다.
요약하면 시의 제목은 무엇보다도 시의 주제나 내용
과 서로 조화되면서 "독자가 그 시의 마지막 행을
읽을 때까지 독자의 의식 속에 계속 다양한 의미망
을 형성하면서 탄력적으로 작용"해야 한다는 임보
님의 말을 경청해야할 것입니다.
아울러 독자들의 가슴에 오래 오래 남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시 읽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임종 전의 아버지 모습을 보고 쓴 신달자님의
<그때 보았다>를 읽어보겠습니다.
어깨 늠름한 젊은 시절
주머니 두둑한 중년의 의젓한
모습에도 엿볼 수 없었어라
한 점 살까지 마음까지
완연 육탈한
다만 순종 두 글자의 뼈로 누운
形骸(형해)의 끝
그때 보았다
오직 두 눈에 넘치는
맑은 섬광
딸이 처음 본
지상의 가장 아름다운
아버지.
이기철님의 <옛집>을 마지막으로 올립니다.
사랑이 있다면 네 발바닥으로 달맞이꽃을
밀어올려보렴
고통을 안쳐 한 그릇 밥을 지어보렴
이념과 체념, 동정과 연민이 들끓어 늘 뒤채이기만 했던
내 삶을
박꽃처럼 어루만져보렴
사랑이 있다면 네 손으로
앞물결만 따라가는 뒷물결의 맹목을 회초리질해보렴
발 다친 벌레도 병든 새도 없는 숲에
음악 같은 달빛을 밀어내보렴
호명해도 이미 쑥갓꽃 같은 유년은 없는 여기
그러나 책장으로 잘려가지 않은 나무들이
가지 끝에 새를 보듬고
새들은 나무들을 하늘로 끌어올린다
물소리는 왜 노래인가
걸어다니지 않는 나무의 일생을 즐겁게 해주기 위함이다.
만 사람이 밟고 가도 몸져눕지 않은 길 끝
내 유년의 별을 따던 옛집에서
사랑이 있다면 피어나는 아픔에게도
애인 같은 이름을 달아주렴
고통아
====================================================
371. 별 / 정진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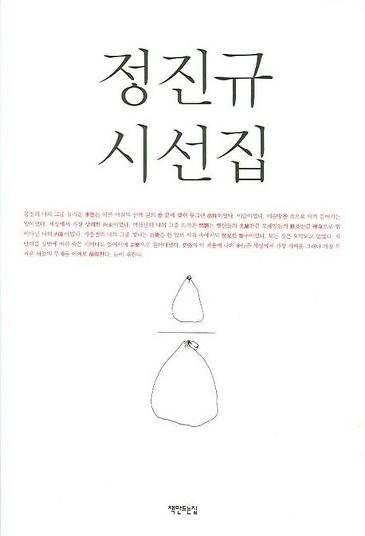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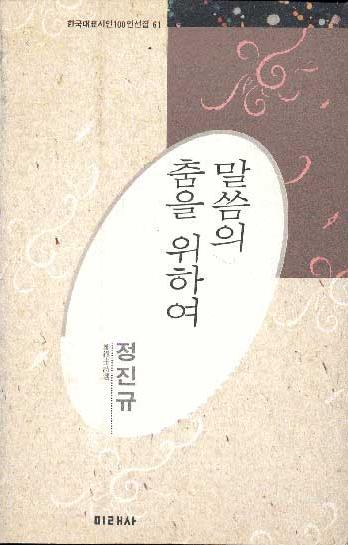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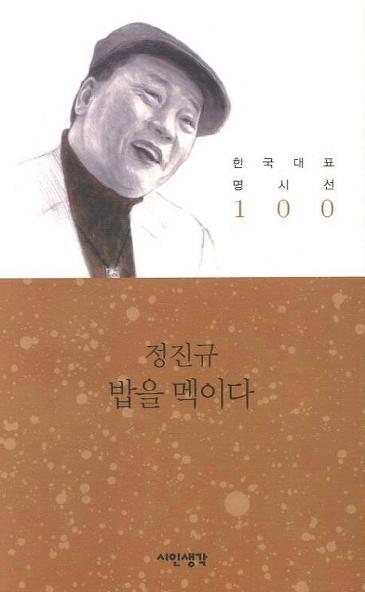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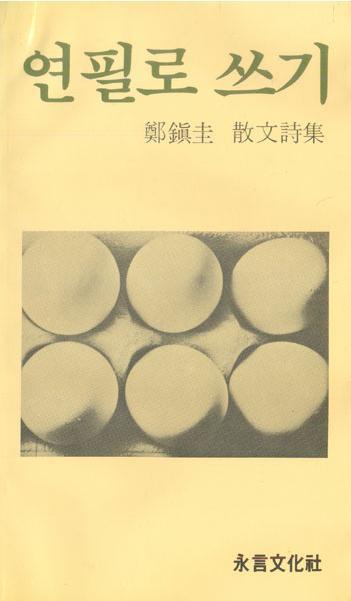

별
정 진 규
별들의 바탕은 어둠이 마땅하다
대낮에는 보이지 않는다
지금 대낮인 사람들은
별들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 어둠인 사람들에게만
별들이 보인다
지금 어둠인 사람들만
별들을 낳을 수 있다
지금 대낮인 사람들은 어둡다
정진규 시집 <별들의 바탕은 어둠이 마땅하다> 중에서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